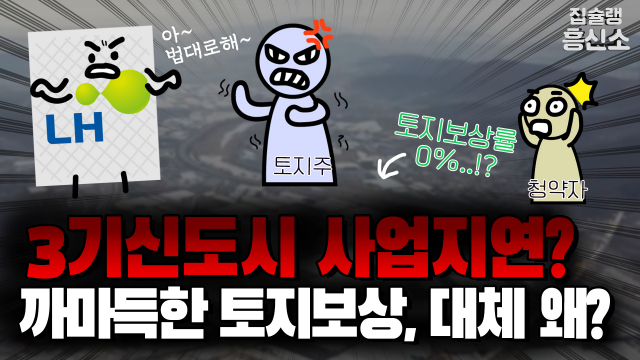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3기신도시 2차 사전 청약이 진행됐다. 이 기간 청약 시스템 접속자 수는 90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 그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는 약 12만 5,000명을 수용할 정도로 큰 규모와 풍부한 일자리 등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돼 청약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도시 사업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남양주 왕숙지구만의 얘기는 아니다. 지난 14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신도시로 예정한 지구 6곳 중 왕숙지구를 포함해 토지보상을 완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사전청약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지만 토지주와 정부 측이 원만한 타협을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 이로써 사전청약 후 1~2년 지나 본청약까지 완료되면 빠르면 25년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사업의 첫 단추인 토지보상단계부터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청약자들은 입주시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기신도시 토지보상문제가 지금까지도 왜 해결되지 못한 문제인지 ‘집슐랭 흥신소’가 알아봤다.
공전협, “정당한 보상 없이 정부에게 토지 빼앗겨”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에 있다. 토지주들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이 같은 불만이 왜 생기겠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원론적으로 현재 토지보상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게 이뤄지고 있다.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2항’에 의거해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세 곳이 결정한다. 평가액은 이들이 각각 정한 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보상가 선정 과정에 LH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의혹 속에 낮은 보상액이 결정돼도 토지주 입장에선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땅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A는 “토지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터전을 강제적이게 수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H·감정평가업계 “현행법에 따라 수행할 뿐"
감정평가업계는 토지주들의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LH가 평가사들에게 개입하면 감정평가사법에 의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며 “토지보상법, 감정평가관련법령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LH가 평가액 책정에 압력을 준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만일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전부 주면 3기 신도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익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LH 측의 입장도 감정평가업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LH 측은 “보상을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 일부에게는 로또를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주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다보니 보상가격에 대한 법령이 그렇게 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LH 측은 “토지보상법을 지정하는 기관은 국회지 LH가 아니”라며 토지수용법에 관해선 공공 사업 시행자이자 정부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제도의 존폐 등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상우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개발이익은 정당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 LH와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 처럼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시대가 달라져 토지보상법 대안이 마련돼야"
기본적으로 현재 제도 내에서도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다.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보상액을 재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도시 등의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근간으로 한다. 정부가 도로, 공항, 철도 건설 등 공익사업을 하려고 만든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됐다. 이후 1980년 산업화가 시작되며 정부는 대규모 택지를 건설하고자 쉽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다. 분당이나 일산, 광교, 동탄과 같은 신도시는 택촉법을 근거로 세워졌다.
물론 1988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개정되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공공’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토지주들의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 해당 토지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단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엔 주택이 많이 개발됐으므로 그러한 인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돼야 한다”며 “수용을 허용하는 방식의 이런 개발 사업은 공공의 필요라는 인정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토지주들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액 등의 대안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