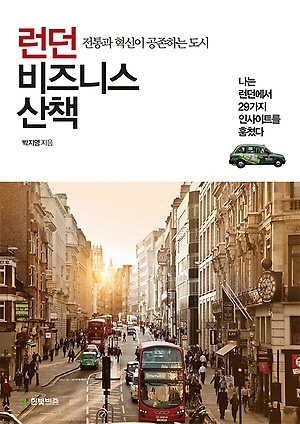|
영국은 위대한 나라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다. 왕과 귀족이 아직 존재하는 군주국이지만 끊임없이 사회주의를 모색한다. 마르크스는 고향인 독일이 아닌 영국에서 '자본론'을 썼다. 또 '영국병'이라는 병에 걸려 몰락하는가 싶더니만 다시 굳건히 서서 세계의 중심지가 됐다. 저자는 이러한 원인을 전통과 혁신의 공존에서 찾고 있다. 천년이 넘게 이어져온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쌓이면서 국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런던을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인식한다. 세익스피어나 조앤 K. 롤링의 문학, 비틀스의 음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공연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면 경제에서는 어떨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비즈니스다. 그래서 책 제목도 '런던 비즈니스 산책'이다. 신문기자 생활을 했던 저자가 런던 소더비 미술대학원에서 비즈니스·마케팅·금융자산 이론을 연구하면서 몸소 부딪히고 깨달으며 분석해낸 결과물이다.
런던이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우뚝 서 있는 이유는 전통을 추구하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감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역사적으로도 영국은 산업혁명의 불씨를 당긴 국가이고, 전세계에서 철도가 처음 놓이는 등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지금도 이런 혁신성은 마찬가지다. 런더너(런던시민)들은 끊임없이 사업을 기획하고 마케팅과 광고로 수익을 내고 있다.
저자가 들고 있는 예를 보자.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공룡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프로그램과 댄스파티를 기획한다. 어떤 기업은 매장내에 상품을 하나도 진열하지 않고 오직 카탈로그만으로 마케팅하면서도 엄청난 매출을 올린다. 또 광고업계에서는 톱스타를 쓰지 않고도 톡톡히 광고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총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 '세상을 바꾼 영국의 비즈니스맨'으로 출발해 2장 '전통과 비즈니스가 만나 세계 금융의 메카가 되다'로 이어진다. 3장부터는 대중교통, 예술, 쇼핑 등 생활과 연계된 런던의 비즈니스 상황을 체험적 시각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영국이 가진 강점으로 '시스템'을 꼽고 있다. 이것은 천년이상의 역사를 통해 다져진 것이다. 또 국민들이 뿜어내고 있는 무한한 '창조성'을 지적했다. 창조경제의 진정한 모습을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의 일부를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저자는 현재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아트 비즈니스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대중 강연과 함께 일간지 칼럼으로도 독자를 만나고 있다.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