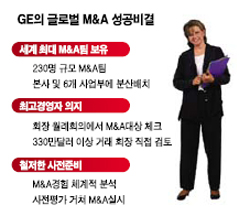|
지난 1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33층.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의 집무실로 계열사 CFP(Corporate Financing Project)팀장들이 모두 모였다. 보브캣을 비롯한 잉거솔랜드의 3개 사업 부문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구성됐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치밀한 점검과 준비를 거쳐 마침내 49억달러의 초대형 글로벌 인수합병(M&A)이 성사됐다. 글로벌 M&A시장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떠오른 두산의 비법은 뭘까. 두산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어떤 대상이든 M&A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고 답했다. ◇글로벌 M&A의 시작은 인재=두산은 M&A를 위해 가장 먼저 충분한 전문가 집단을 형성했다. 맥킨지에서 영입해온 비모스키 ㈜두산 부회장, 이상훈 ㈜두산 부사장,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등은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망으로 두산의 글로벌 M&A 전략을 움직이고 있다. 계열사마다 포진하고 있는 CFP팀도 두산이 글로벌 M&A 시장에서 가지는 노하우. 외부 공개를 꺼리는 CFP팀은 외국계 컨설팅 및 회계법인 출신들로 계열사마다 전략기획팀ㆍ기획팀 등의 이름으로 M&A를 통한 두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보브캣의 인수에 직접 나선 이상하 두산인프라코어 전무도 CFP팀장. 이 전무는 OB맥주 시절부터 계열사 매각작업에 깊숙이 관여하며 그룹 내 M&A 전문가로 통한다.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M&A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로벌 M&A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꼽는다. 이들의 가장 큰 역량은 M&A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글로벌 M&A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하다.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은 빠르게=글로벌 M&A 시장은 기업간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략과 인맥이 총동원되는 종합격투기다. M&A 업무에 잔뼈가 굵은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컨설팅그룹 등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피를 말리는 전쟁이다. 김종태 M&A포럼 대표는 “글로벌 M&A는 타이밍의 미학”이라며 “M&A 대상을 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밀어붙일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굿이어의 타이어코드 공장을 인수하고 중국 변압기 업체인 남통우방에 이어 독일 아그파 자산을 사들인 효성은 오너의 M&A에 대한 의지가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축소시켰다. “가치가 있다면 어떤 기업도 인수할 수 있다”는 조석래 회장의 말은 M&A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조현상 전략기획팀 전무에게 힘을 실어주며 효성의 M&A에 속도를 붙인다. 두산의 의사결정도 여타 그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수익성보다 미래가치를 따지는 두산의 M&A 철학은 두산의 M&A 전략이 경쟁사보다 한발 빠르게 한다. “M&A의 속도감에 한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말은 잉거솔랜드 사업 부문 인수 후 쉬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두산의 M&A에 한층 가속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한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너무 비싸다.” 두산이 지난 2005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를 1조6,880억원에 인수했을 때 업계의 반응이다. 2년이 지난 7월 말 잉거솔랜드의 3개 사업 부문을 49억달러에 인수했을 때도 업계의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우종합기계 인수는 멋들어지게 성공했으며 보브켓 인수 역시 시장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2001년 이후 90%의 M&A 승률을 자랑하는 두산의 또 다른 성공비결은 ‘과감한 베팅’. 계열사 매각으로 최소한의 실탄을 마련한 후 인수 기업의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과감한 자금조달을 실시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인수자금도 인수금융 주간사인 산업은행이 기업 미래가치를 인정해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으로 재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입맛에 맞는 인수 대상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실탄이 없다면 남의 떡일 뿐”이라며 “준비된 기업만이 필요한 기업을 M&A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