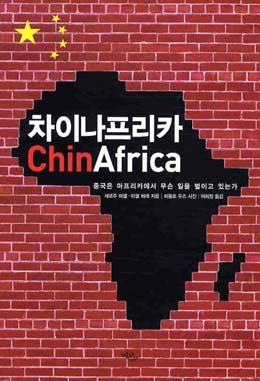|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올 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세네갈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면서 수백억달러 규모의 원조 및 차관협정을 맺었다. 중국은 케냐에 300만달러 규모의 무상원조에 이어 앙골라엔 1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아프리카 차관의 상당부문을 원유로 돌려받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천연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국의 잰걸음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0개월동안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 원자바오 총리 등이 아프키카 순방길에 올라 31개국을 방문할 만큼 적극적이다. 석유와 지하자원이 풍부한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파워가 서구 열강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으로 점점 기울고 있는 형국이다. 프랑스 언론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알베르 롱드르 상을 수상한 세르주 미셸과 스위스 시사주간지 레브도의 외신부장인 미셸 뵈뢰 등은 아프리카 15개국을 돌아다니며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밀착 취재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80~2005년까지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간의 무역은 이전보다 50배가 늘었으며, 2010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이미 중국기업 900개가 아프리카에 진출했고, 2007년 프랑스를 제치고 아프리카 제2의 무역국 자리에 중국이 올랐다. 아프리카에선 이제 '봉주르' 보다 '니하오'가 더 정감있는 인사말로 바뀌고 있다. 저자는 프랑스ㆍ중국ㆍ아프리카 간의 역학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설명한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의 시녀였던 아프리카가 해방 후 첩이 됐고, 아프리카 보다 얌전하고 전망이 있어 보이는 아시아 국가들에 프랑스가 한눈을 파는 사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 정략결혼을 제의한 중국과 아프리카가 결혼을 하면서 한결 같은 성의표시를 해 온 중국이 아프리카에 호의적인 상대가 되는 동안 프랑스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고 풀이한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1단계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기아, 인권문제 등을 심각하게 제기한 것과 달리 중국은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아프리카를 세계 무대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여년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아프리카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 주는 동안 그 어떤 서구국가도 아프리카의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중국의 진출 이후 미국ㆍ유럽ㆍ일본ㆍ호주 등의 투자 등 비즈니스 진출이 늘어났으며 이를 계기로 '검은 진주'아프리카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중심의 중국 진출 전략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중국인들을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졌고, 알제리의 중국인 숙소에서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또 앙골라와 잠비아는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책 말미에는 중국의 경쟁국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콩고 민주공화국 면적의 1/23에 불과하지만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인 한국이 단지 노동력을 제공해 알맹이를 빼먹겠다는 심산인 중국과 달리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데 주력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차근차근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