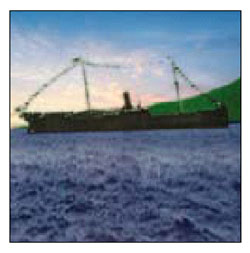|
‘저게 정녕 우리 군함인가.’ 1903년 4월15일 인천에 입항한 양무호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엇보다 덩치가 컸다. 일본 화물선의 크기가 평균 580톤이던 시절에 3,432톤짜리 철선이 들어왔으니 놀랐음 직하다. 고종황제가 ‘나라의 힘을 키운다’며 하사한 ‘양무(揚武)’라는 이름의 대한제국 최초 군함에 조선은 우쭐했으나 내용은 속 빈 강정이었다. 영국이 1881년 건조한 원양화물선 팰러스(Pallas)호를 일본 미쓰이물산이 1894년 25만엔에 구입해 9년간 써먹은 석탄운반선에 불과했다. 군함 개조공사를 거쳤다고 했지만 청일전쟁에 동원됐다 퇴역한 일본 군함에서 떼어낸 구식 함포 4문을 달아놓은 정도였다. 도저히 군함으로 불릴 수 없는 배였지만 계약가는 무려 55만엔. 사기와 다름없었다. 대한제국이 과연 국방예산의 4분의1, 총예산의 10%에 이르는 돈을 지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연체이자까지 물었다는 설과 월 5,000원씩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바꿨다는 설이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원ㆍ선장도 없이 무작정 배부터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소모되는 석탄 43톤을 감당하기 힘들어 항구에 묶여 있다 러일전쟁 발발 후 일본 해군에 강제 징발돼 수송함으로 쓰였다. 양무호는 결국 한일합방 직전 일본 해운회사에 헐값(2만1,000엔)으로 되팔렸다. 대한제국은 왜 양무호 구입을 비롯해 예산의 30~50%를 군사비로 지출하고도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줬을까. 간교한 일본보다도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친일관료 탓이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다. 양무호 도입 105주년. 일본과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효율적인 국방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