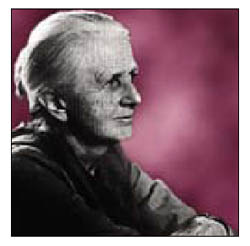|
1975년 10월 중순, 비즈니스뉴스위크지에 비명이 울렸다. ‘조앤 로빈슨, 여성 최초 노벨경제학상 수상’이라는 특집기사를 마련해 인쇄까지 마쳤으나 다른 사람들이 상을 받았으니까. 단골 후보였던 로빈슨이 ‘여성의 해’에도 상을 받지 못한 지 32년이 지나도록 경제학상은 남성의 전유물이다. 로빈슨은 왜 사망(1983년ㆍ80세)할 때까지 노벨상에서 제외됐을까. 여성이기에? 아니면 적이 많았던 좌파라서? 논쟁 속에서 살았던 그의 기질은 출생(1903년 10월31일)부터 갖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사회개혁가였던 증조부와 병사들의 비참한 환경을 외면하는 총리를 대놓고 비판한 부친(육군소장 모리스경)의 피를 받았기 때문일까.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의 명저 중 로빈슨의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평할 정도로 그는 광범위한 분야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로빈슨의 업적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미시경제학의 신지평을 열었다는 ‘불완전 경쟁의 경제학(1933년)’과 케인스의 단기이론을 장기화한 ‘자본축적론(1956년)’의 저자이자 1950~60년대 영국과 미국을 달군 ‘자본논쟁’을 촉발하고 승리한 주역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최고의 분석가로도 꼽힌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웃에 손해를 끼치며 발전했다는 ‘근린 궁핍화 이론’도 만들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도 남겼다. 한국에서 그는 생소하다. 이름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억압의 시대 탓이다. 논문 ‘코리아 미러클(1965년)’에서 북한의 경제기적을 극찬했었으니까. 로빈슨은 더욱 잊혀질 것 같다. 케인스 경제학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날을 내다보고 한 말일까. 35년 전 그가 처음 사용한 용어가 여전히 회자된다. ‘경제학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