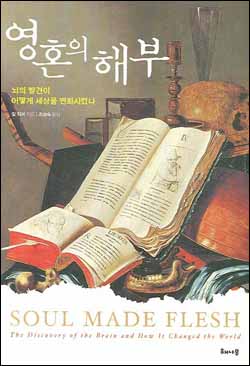|
"우울이나 광기가 정신의 병이 아니라 두뇌에 생긴 화학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17세기 초까지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수세기 전에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 속에 있는 '뇌'가 물컹한 기름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당시에는 인간의 영혼과 감정, 나아가 지성도 '뇌' 대신 사람의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영혼의 중심이 어디인지 찾아 헤매며 끝없는 탐구 끝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선구자도 있었다. 영국 옥스퍼트 의대의 토머스 윌리스(1621-1675) 박사가 주인공이다. 저자인 칼 지머는 미국 과학잡지 '디스커버'의 수석 편집장을 지낸 과학 평론가로 340여년 전 윌리스 박사가 이뤄놓은 성과를 연대기 순으로 고스란히 책에 담아냈다. 칼 지머는 "윌리스는 신경학(neurology)이라는 신분야를 개척하며 인간의 두뇌라는 미지의 대륙을 찾아 나선 선구자"로 평가한다. 17세기 초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영혼으로 인해 인간은 절대 불멸한 존재'라는 생각을 바꾸도록 윌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영혼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뇌(특히 신경의 움직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윌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학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오늘날 윌리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이유는 아이러니칼 하게도 그의 제자였던 존 로크의 책임이 크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윌리스의 후계자인 로크는 계몽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스승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 윌리스는 의술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해부와 현미경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로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로크는 "해부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육신의 조악한 부분이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다"고 스승을 비판했다. 하지만 150년이 지난 뒤 신경학자들은 윌리스가 옳았고, 뇌의 해부구조와 화학작용에 대한 연구가 정신의 작용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저자는 딱딱한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기록을 소설적 재미를 가미해 읽기 쉽게 풀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