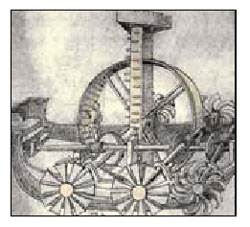|
1421년 6월19일 베네치아 의회가 특허장을 내놓았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문서화한 특허장이다. 주인공은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선구자로 꼽히는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브루넬레스키가 인정받은 것은 예배당. 요즘 기준으로도 불가사의한 규모인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돔형 지붕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특허가 싹텄다. 지름 43m, 높이 160m짜리 돔을 지을 재료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한 배가 바로 첫 특허의 대상이었다. 문제는 운송. 거대한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브루넬레스키의 해답은 정교한 배.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을 가진 ‘바달론(Badalon)’의 발명도 이런 차원에서다. 바달론은 성공했을까. 강가에 가라앉았다. 실패했어도 그 정신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 각지로 번졌다. 바다를 지배한 나라들이다. 만약 이탈리아가 최초의 특허를 살렸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럴 수 있었다. 두번째로 특허권을 명시한 것은 같은 베네치아 의회 상원이었으니까. 베네치아는 1474년 특허법률을 만들었지만 뒤를 이을 사람도, 힘도 없었다. 영국의 특허권 보편화·제도화는 개인의 발명의욕을 북돋웠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근대화에 뒤처진 이유를 특허권 제도의 낙후성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구대륙의 실권자 프랑스와 스페인이 기득권을 의식한 특허권에 집착했을 때 영국과 미국은 그것을 단순화했다. 1880년대 이후 세계 1위의 특허국인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가 여기에서 갈라졌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 앵글로색슨의 지배가 특허 때문이라면 과언일까. 우리는 어떨까. 세계 4위권이다. 한국 과학자들의 생각이 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미래가 발상과 특허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