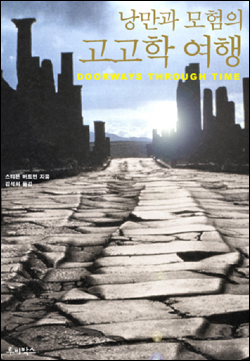|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개봉 소식이 영화팬들을 기대감으로 들뜨게 하는 이유가 꼭 해리슨 포드라는 멋진 배우,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재능있는 감독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영화가 다루는 고고학이라는 주제도 그 설렘의 원천이 아닐까. 낡은 사파리 재킷에 챙이 넓은 모자, 작은 꽃삽과 솔을 주머니에 꽂고 지도를 손에 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고고학자는 학문적 탐험가인 동시에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여행의 안내자다. 신간 ‘낭만과 모험의 고고학 여행’의 저자 스티븐 버트먼 캐나다 윈저대 교수는 점잖은(?)‘인디아나 존스’를 자처한다. 그는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모험과 낭만으로 가득한 고고학 이야기 26편을 펼쳐 보인다. 고대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인 우르의 왕묘 유적. 순장된 여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은제 머리 리본을 두고, 저자는 왕의 장례식에 늦을까봐 서둘러 나서는 바람에 이 여인은 리본을 미처 머리에 달지 못한 채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다고, 상상력의 나래를 뻗는다. 이 무덤에는 호위병 6명과 86명의 궁녀들이 함께 묻혀 ‘거대한 죽음의 구덩이’라 불린다. 최근 중국 쓰촨성 지진이 순식간에 인명과 문명을 앗아간 것처럼 서기 79년 8월의 어느날, 로마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순간멈춤’ 돼버린다. 6m이상의 화산재 유적인 폼페이 발굴이 쉽지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은 정욕으로 요란하게 채워진 저택의 벽화와 외설적인 조각과 음탕한 낙서로 가득찬 좁은 매음굴 등을 통해 당시의 문란한 풍속을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었다. 책은 선사시대에 그려진 라스코 동굴벽화부터 사람의 피에서 양분을 얻는 태양신을 섬기던 아스텍 문명과 신대륙 초기 식민지 시대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담고 있다. 신춘문예 당선 이력이 있고 한국번역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석희씨의 매끄럽고 문학적인 번역이 읽는 맛을 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