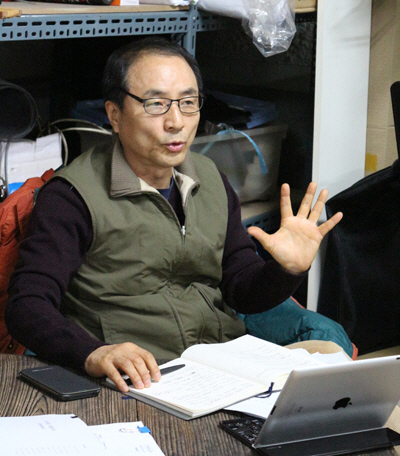|
이유도 모른 채 사랑하는 남자에게 외면 당한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와 오빠를 사랑하는 사람 손에 잃는다. 비극의 이유도 모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은 정신을 놓고 떠돌아 다니다 강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
"현대 사회에선 전혀 공감을 살 수 없는 여성상이죠." 김명곤(사진) 전 문화부장관(아리 인터웍스 대표)가 동서고금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다른 각도로 바라본 이유다. 김 대표는 5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리는 뮤지컬 '오필리어'의 연출을 맡아 순종적이고 희생적이기만 한 중세시대 여인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켰다. 명작 고전이라는 이유만으로 500여년전의 여성상에 관객이 빠져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여주인공 이야기를 '확' 뜯어 고쳤다.
서울 둔촌동의 지하 연습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햄릿의 연인이자 원작의 조연인 오필리어를 새로운 캐릭터로 끌어내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왜 오필리어였을까. 연출 의도를 묻자 굵고 짧은 한마디가 돌아왔다. "여자 팔자 뒤웅박이란 이야기가 요즘도 통하나요?" 그는 "햄릿의 연인인 오필리어는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캐릭터로 가부장 사회였던 중세시대의 남성중심적 여성상"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이 캐릭터와 원작의 결말이 공감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10년 전부터 "왜 오필리어는 자기 삶에도 나약하기만 한 존재로 그려지는가"에 대해 고민했다는 그는 8년 전부터 '햄릿의 여자'가 아닌 '인간 오필리어'에 관심을 두고 작품을 구상했다. 이야기의 중심이 '죽느냐 사느냐'의 햄릿이 아닌 '복수냐 사랑이냐'를 고민하는 오필리어로 이동한 것이다.
450년간 이어져 온 햄릿의 스토리를 뒤집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원작이 워낙 명작인 데다 캐릭터와 구성도 튼튼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어려웠다." 커피를 한 모금 넘긴 그의 미간엔 잠시 주름이 잡혔다. 커피의 쓴맛 때문인지, 지난 8년간의 고된 작업이 떠올라서인지 모를 묘한 표정이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다시 써도 '이건 여전히 햄릿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다"며 "8년간 조금씩 원작에 없는 새로운 설정과 사건을 만들어 내면서 이야기의 중심에 오필리어를 끌어들였다"고 회상했다.
"요즘 말로 '쿨'한 여자를 그리려고 했다." 원작의 오필리어가 누구의 여인으로, 누구의 딸과 여동생이란 사슬에 묶여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번 뮤지컬에서는 스스로 '굴레와 사슬을 벗어 던지자'고 외치는 당찬 여성으로 그려진다. 김 대표는 "햄릿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 특히 사랑으로 고민해본 20~3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전의 내용을 너무 비틀어 버린 것은 아닐까. 김 대표는 오히려 "현대 관객에게 고전, 특히 외국의 고전은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며 "고전은 그 시대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품은 딸 아리씨와 함께하는 작품이란 점에서 김 대표에게 더욱 의미가 크다. 아리씨는 현재 아리 인터웍스의 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2년 전 아서밀러의 '샐러리맨의 죽음'을 각색한 연극 '아버지'를 통해 부녀가 첫 호흡을 맞췄다. 2년 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했다면, 이번엔 딸의 이야기를 부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셈이다. 김 대표는 "(딸이) 아직은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면서도 "일을 하다 이견이 생길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받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이상 가부장 사회가 아니다"며 당찬 여성 오필리어를 그린 김 대표. 한 여자의 남편이자 20대 딸을 둔 아버지인 그는 '햄릿 시대의 가장'일까 '오필리어 시대의 가장'일까. 조금은 짖??은 질문에 "나는 꼼짝도 못해요"라는 말과 함께 소박한 너털 웃음이 들려왔다.
오필리어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