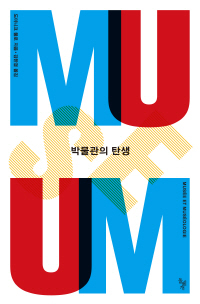|
|
|
진귀한 예술품·장식품·기구 등 전시… 영국의 특별한 박물관·수집문화 소개
루브르박물관·퐁피두센터와 함께 프랑스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지난해 이곳에는 익숙한 명화와 이를 테마로 한 남성 누드를 엮은 '남성 대 남성-1800년부터 현재까지 예술 속 남자 누드' 특별전이 열렸다. 이를테면 18세기 말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의 제자 장 브록이 그린 '히아신스의 죽음'과 이를 패러디한 '다비드와 조나단'이 나란히 걸렸다. '다비드와 조나단'은 두 남자가 성기까지 노출한 나체로 껴안고 서 있는 사진 작품. 이런 파격은 이제 프랑스에서 낯설지 않다. 2002년 프랑스에서 통과된 새 박물관 법은 기존의 '교육 목적의 박물관'을 버리고 '오락 목적의 박물관'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원칙을 따랐을 정도다. 엄숙하고 위압적인 이미지에서 한 층 내려와 관객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물관에 대해 여러 각도로 조망하는 두 책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됐다. 먼저 '박물관의 탄생'은 박물관이 어떻게 시작해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 변화를 이끈 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살펴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근대적 박물관의 개념은 18세기부터다. 시작은 중세 왕가와 브루주아의 컬렉션. 어마무시한 소장품 목록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과시'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렇게 비슷한 계급끼리 소장품을 돌려보던 박물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을 거치며 시민의 권리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박물관의 고민은 다양한 소장품 리스트보다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와 주제 속에 소장품을 배치하느냐가 그 명성을 좌우하는 것이 됐다. 이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즘과 파시즘을 겪으며, 박물관은 이념과 체제 선전,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당연히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 편안한 관람과 동선을 고민하고 최적화된 공간, 건물 구성을 건축가에 요구하게 됐다.
이 책이 박물관의 인문학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값비싼 잡동사니는 어떻게…'는 이웃나라 영국의대표적이고 특별한 박물관 26곳을 들여다본다. 영국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박물관이 있는 나라로, 현재 그 수는 2,800개에 달한다. 굳이 국토 면적과 인구를 들먹이지 않아도 400여개에 불과한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대학병원 간호사였다가 방향을 틀어 영국에서 박물관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독특한 이력의 저자는 박물관이 많은 이유를 역사에서 찾는다. 로마와 바이킹족, 노르만족에게 지배된 오랜 역사가 문화로, 유적지로 남아있고, 17~18세기 세계적 위세를 떨쳤던 시절 귀족 사이 유행한 '그랜드 투어'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서유럽을 넘어 수많은 식민지까지 이어진 여행에서 온갖 진귀한 예술품과 장식품, 가구 등을 모아 가문의 초기 소장품이 됐다. 이미 영국에서는 1759년 세계 최대 식물원인 왕립식물원이 설립됐고, 1851년에는 세계의 중요한 물건을 모아 런던만국박람회를 열었다. 영국 특유의 수집문화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영박물관과 국립미술관도 소개하지만, 그보다는 낯설고 특이한 콜렉션에 더 주목한다. 왕실 성을 개축한 엘섬 궁, '해리 포터' 촬영지였던 안위크 성, 시민 회비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국립수로박물관과 런던운하박물관 등 어지간한 여행자로는 찾기 힘든 박물관과 콜렉션을 소개한다. 또 기후 박물관인 에덴프로젝트, 도자기를 주제로 한 웨지우드박물관, 19세기 말 쾌속선을 그대로 옮겨 박물관으로 만든 커티삭 등도 눈길을 끈다.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