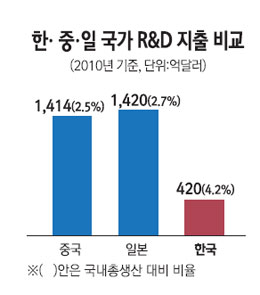|
지난해 서울대의 한 과학교육 관련단체에서 서울 강남의 모 초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물었다. 10명 중 7명의 장래희망은 연예인, 1명은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과학자라고 답한 학생은 100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열에 일곱은 장래희망이 과학자라고 답했던 기성세대의 순수함(?)은 옛일이다. 2011년 신묘년(辛卯年). 변곡점에 선 우리 경제에 서울경제신문이 던지는 화두는 '과학기술 강국'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교육'에 걸었던 서울경제신문은 이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말한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 경제의 디딤돌은 과학입국(科學立國). 척박한 땅에 뿌려진 과학의 씨앗은 지난 1960~1970년대 공업화의 기반이 됐고 1980년대 수출강국과 1990년대 IT강국의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과학기술은 현재 미래를 설계하지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책적 뒷받침도, 사회적 관심도 사라지며 정치적 논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전문 과학기술인 626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점수를 평가했다. 결과는 낙제점. 전체 응답자의 67.2%는 현 정부의 과학정책이 70점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하점수인 60점 미만도 28.4%에 달했다. 물리학자인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날을 다시 찾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정책 실패의 첫 사례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꼽았다.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과학정책이 부처별로 이리저리 쪼개지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화되기는 했지만 과학인들은 과연 국과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낸다. 실질적인 예산 조정ㆍ배분 권한이 없어 기획재정부 등 힘있는 부처들과의 다툼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다. 과학기술인들은 이제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연구에서 창의적ㆍ모험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탈추격형ㆍ선도형 연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