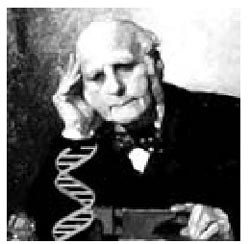|
골턴(Francis Galton)은 모든 것을 측정하려 들었다. 여성들의 생김새에 점수를 주고, 접근이 불가능한 여성의 신체를 멀리서 항해용 육각의로 잰 적도 있다. 측정에 광적으로 집착한 골턴의 원래 직업은 의사. 찰스 다윈의 고종사촌으로 1822년 태어난 그는 스무살 때 사망한 부친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뒤 의학을 집어치우고 하고 싶은 일에 파묻혀 평생을 보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집중력 기계’와 ‘수중 독서기’도 발명했다. 1911년 1월17일, 89세로 사망하기까지 다양한 학문에 매달렸던 골턴은 인류에 세 가지 유산을 남겼다. 첫째는 지문(指紋) 인식. 지문의 특성을 학문적으로 밝혀내 수사에 활용되도록 유도했다. 두번째는 회귀분석 개념 마련. 부모의 키가 자손에게 전달되지만 결국은 평균신장으로 돌아간다는 통계를 근거로 평균으로의 회귀와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켰다. 계량경제학과 주가상관 분석에 기초를 제공한 셈이다. 세번째는 우생학 창시. ‘우리 가문은 왜 인재가 많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통계조사는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유전’이라는 결론을 낳았다. ‘우생학(Eugenics)’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골턴은 인류를 위해 ‘우수 유전자간 결혼을 장려하고 장애인 등은 수도원 같은 편안한 시설에 격리, 단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틀러의 인종 대청소도 골턴 우생학의 뒤틀린 결과다. 과연 골턴 우생학은 맞는 이론일까. 니체의 여동생이 110여년 전 ‘우수 독일인’을 모아 파라과이에 세웠던 ‘누에보 게르마니아(새 독일)’ 마을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생학은 죽지 않았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다른 유전자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