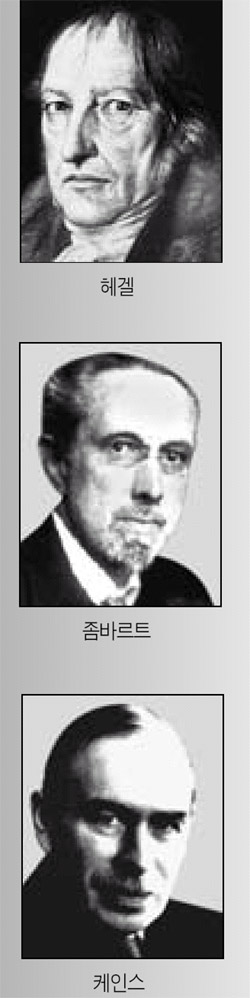|
|
|
|
|
자본주의 최대의 적은 누굴까. 칼 마르크스? 글쎄. 공산주의자들만큼 시장경제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따로 있다. 교회다. 성직자들에게 상업은 미천한 것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해 ‘최초의 근대인’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마저 ‘부의 축적은 천박하다’는 말을 남겼다. 신교도 마찬가지다. 1784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부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기독교의 정수는 썩어 들어간다’라고 한탄했다. 그리스ㆍ로마 초기에 형성돼 근대시민의식의 주춧돌이 된 ‘시민 공화주의’의 이념도 자본을 부정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자본주의가 종교 이데올로기와 반 시장적 시민정서를 어떻게 뚫고 나왔냐는 점이다.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제리 멀러(Jerry Muller)의 ‘자본주의의 매혹’에 그 해답이 있다. 자본주의의 태동과 위기, 성장은 도전과 응전의 소산이라는 것. 저자는 경제학자는 물론 철학자까지 포함하는 사상가 16명을 내세워 자본주의의 발달사를 경제와 정치, 문화, 철학이라는 다양한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16명에 이르는 사상가 중 1번 타자는 볼테르.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로 저술ㆍ강연활동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최초의 지식인이었던 그는 종교의 자본 천시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독교의 불관용에 넌덜머리를 낸 그는 영국을 방문한 후 ‘런던의 증권거래소는 법정보다 더 존경 받을 만하다. 유대인과 이슬람교도, 기독교인이 같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평화롭게 거래한다. 믿을 수 없는 이교도란 신용불량자에게 적용된다’고 적었다. 시장에 대한 찬사다. 가난했던 볼테르가 훗날 프랑스 20대 부호에 오른 것도 사기와 불법을 동원해 돈을 벌었다는 욕을 먹으면서도 ‘시장’의 허점을 파고 들었던 덕분이다. 시장의 위대함과 효율성에 대한 논증은 아담스미스에 이르러 보다 정교해졌다. 시장경제와 산업혁명 덕에 실물경제 성적이 좋아지자 자본주의의 질주를 질시하는 계층이 생겨났다. 마르크스에 앞서 자본주의를 죄악으로 규정한 것은 보수계층. 독일의 유스투스 뫼저는 ‘시장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경제근간을 해친다’며 ‘경제 글로벌’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직업과 경제적 지위가 성취보다는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봉건적 제도야말로 인간 경험이 만들어낸 최적의 제도라고 여겼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논리지만 당시에는 추종자가 많았다. 현대 보수주의의 원조다. 저자가 다수의 사상가를 끌어들여 공산주의나 인종차별주의, 히틀러식 극우적 사회민주주의 복지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연관시킨 것도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과 위기, 성장을 다양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모두 697쪽에 이르는 분량이 부담스럽지만 철학도나 경제ㆍ경영학도라면 놓치면 아쉬운 책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있다면 곱씹어가며 읽을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자본주의=우파, 사회주의=좌파’라는 등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위험한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을 치밀하게 주장하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시장에 대한 풍만하고 완성된 시각’이다. 서찬주ㆍ김청환 역. 3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