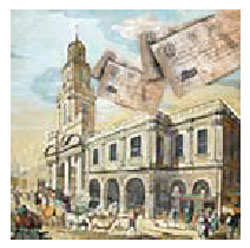|
1693년 12월15일, 영국 의회가 국채법을 통과시켰다. 특징은 채무자가 왕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 국왕의 이름으로 채권을 남발했던 에스파니아와 프랑스의 공채와는 차원이 달랐다. 최초의 국채로 간주되는 채권이 영국에서 나온 이유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으로 국왕의 징세권이 사실상 사라져 의회가 국가의 이름을 빌려 돈을 조달했다. 건함세 등 세금 부과에 맞서 국왕(찰스1세)까지 처형했을 정도로 돈을 내기 싫어했던 의회가 앞장서 재정 확대를 꾀한 배경은 전쟁. 에스파니아 왕위계승전쟁 등 26년간 이어진 전쟁과 프랑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확충 때문에 국채를 찍었다. 의회를 장악한 귀족ㆍ지주계층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국채 발행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국채를 소화할 만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잉글랜드은행이 탄생(1694년)하고 증권거래가 늘어났다. 잡다한 채무를 모아 국채로 전환하면서 단기부채를 장기부채화하는 효과도 거뒀다. 국채와 주식을 연계하는 금융기법도 속속 선보였다. 잉글랜드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고 남해회사(중남미 무역업)는 은행 주식을 재원으로 새로운 주식을 공급했다. 영국이 식민지 경쟁과 주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것도 통화공급을 늘리거나 세금을 추가 징수하지 않고 시장에서 신용과 부가 연속 창출된 금융 시스템 덕분이다. 국채를 매개로 하는 금융혁신은 남해회사 버블 사건 같은 공황도 야기했지만 해군을 키우고 상거래와 발명ㆍ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혁명으로 이어졌다.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도모한 금융혁신, 나라의 장래가 밝다는 자신감, 주식을 사면 오른다는 희망의 3박자가 산업혁명과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이끈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