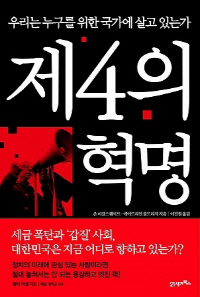|
저자는 지금까지 3.5차례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17세기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제1의 혁명', 18세기말~19세기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권리를 제한했던 '제2의 혁명'과 뒤이어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명적 생활기반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제3의 혁명'이 그것이다. 여기에 무분별한 복지국가를 막기위해 신자유주의가 주창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반쪽 혁명'까지 저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은 세개 반의 혁명을 거쳐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의 형태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분석한다. 혁명은 정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지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뛰어난 정부조직이 지난 300년간 서양국가들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나간 요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다시 변했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최고의 경제체제로 신봉됐던 자유주의도 한계에 봉착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불균형한 복지, 정부의 무능력,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환멸 등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제 다시 '제4의 혁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 나은 정부'를 통해 더 나은 세상과 체제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 책의 목소리다. 저자는 실용주의라는 원칙에 근거한 변화를 요구한다. 어떤 신념보다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실용적 기술이 경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신문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건드리는 모든 것마다 혁명을 일으켰다. 누구나 냄새나는 강당에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아이패드로 세계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의 민간기업들이 겪은 슬림화, 집중화, 조직계측의 단순화를 통해 변신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길들여져야 하고 통제하에 양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새로운 정부 개혁의 대안이자 혁신의 선봉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된 중국과 싱가포르의 개혁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콴유에 의해 상징화된 권위주의와 작은 정부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도 이를 따라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21세기에 각국 정부가 겪을 혁신을 굳이 '제4의 혁명'으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 "정부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만큼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는 게 저자의 대답이다. 1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