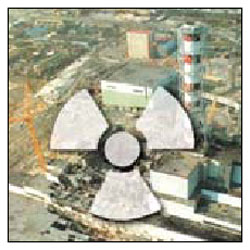|
1986년 4월26일 새벽1시23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터졌다. 원인은 조작 실수. 터빈 발전기의 관성시험을 위해 출력을 내리려다 운전 미숙으로 정지상태까지 떨어지자 급속하게 출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50배 규모에 이르렀던 원전 폭발의 가장 큰 후유증은 낙진. 방사능을 포함한 연기가 1㎞ 상공까지 치솟은 후 사방으로 뿌려졌다. 체르노빌에서 130여㎞ 떨어진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인 키예프는 물론 유럽 지역까지 방사능 물질이 퍼졌다. 인명 피해도 컸다. 31명이 사망하고 원자로 주변의 주민 9만2,0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옮겼다. 6년간 발전소 해체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5,722명과 주변 민간인 2,510명도 죽어 나갔다. 방사능은 43만명의 인근 지역 주민 43만명에게 암이나 기형아 출산이라는 후유증도 안겼다. 참상이 알려진 것은 사고 나흘 후부터. 소련이 보도를 통제했으나 입에서 입을 타고 소문이 퍼졌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침묵하던 소련 당국의 첫 공식 반응은 부인. 서방 언론의 보도를 ‘악의에 찬 날조’라고 몰아붙였다. 사고를 시인한 것은 보름이 지나서였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지구촌의 역사를 바꿨다. 소련의 개혁과 개방도 체르노빌 사고를 당하면서 낙후된 기술력과 폐쇄구조의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주요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거나 미뤘다.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거뒀다. 세계 유일의 시장으로 남은 한국의 원전 공사를 따내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등이 관련 기술을 넘기기 시작한 게 한국형 원전기술의 원천이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부터 다져진 한국형 원전은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해 비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