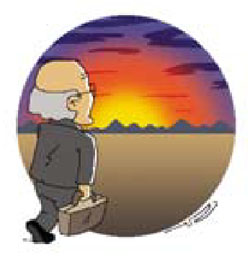|
1979년 7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 그가 금리를 단박에 2.5배나 올려버린 건 임기 시작 불과 4개월만의 일이다. 5~8%였던 금리가 무려 17~18%로 치솟았다. 그로부터 3년. 최고 21%까지 오른 고금리 정책으로 미국의 가구당 소득은 1만 달러, 국민총생산은 20%나 추락했다. 업계부터 가만 있을 리 없었다. 시골에서 상경한 농부들은 썩은 야채를 담은 꾸러미를 워싱턴 FRB 건물 앞에 쌓아놓고 격렬히 시위했다. 심지어는 그에 대한 암살 시도까지 생겨났다.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미국 경제의 두자리 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볼커의 선택은 초긴축 정책. 온갖 반발과 비난에도 그는 꿈적하지 않았다. 인플레의 싹을 자르고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의 확신은 그대로 ‘신앙’이었다. 그로부터 20년. 이른바 ‘저물가 고성장’으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 영광의 토대를 쌓은 이로 볼커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지만 결국 그가 옳았다. ‘고통 박사’(Mr. Pain)-볼커에게 따라 다닌 별명이다. ▦1987년 8월 볼커의 바통을 이어받은 앨런 그린스펀. 그는 전임자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FRB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취임 첫해인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로 주식시장이 폭격을 맞자 통화를 완화한 그린스펀은 이듬해 봄부터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리고 그 기조를 89년 봄까지 유지, 인플레이션과 기대 심리를 돌려놓는 노력을 이어갔다. 94~95년의 금리 인상은 특히 성공적이었으며 이후 미국은 안정적 물가 속에 3%대가 넘는 고성장 시대를 맞았다. 레이건에서 부시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번번히 거절한 적지 않은 일화들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그의 신념과 고집을 말해준다. 매우 비슷해보이면서도 다른 캐랙터의 두 사람. 볼커와 그린스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反) 인플레이션 대응의 핵심은 이른바 ‘선제적’(preemptive) 금리 정책이다.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를 향해 질주한 두 사람 중 볼커가 ‘뚝심형‘ 정책가라면 그린스펀은 반 발짝 밀리는 듯한 뚝심을 ‘정책의 섬세함’으로 보충해 온 컨트래스트가 있다. ‘캐리 커처용으로 그만’이라는 만화 같은 얼굴의 이 두 고집불통 영감님들이 엮어 낸 작품-바로 오늘의 미국 경제다. ▦“신경제 거품에 대처하기 위한 FRB의 시도가 미국 경제가 자산 거품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빌미가 됐다” 최근 미 월스트릿저널 보도다. 신문에 따르면 신경제 거품 붕괴 속 지난 2001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리를 45년 래 최저 수준으로 끌어 내린 FRB의 결단에 힘 입었다는 것. 그러나 미국 경제를 수렁에서 끌어올린 저금리가 지금 미국 내 빚더미 잔치 판을 만들며 저축은 끌어 내리고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부작용를 가져 옴으로써 미국 경제에 새로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 경제 ‘마이더스의 손’ 그린스펀이 또 한번의 선제적 금리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선택을 할 것인가. ‘비이성적 과열’-그에 대한 평가가 과대 포장돼 있다는 그의 말을 빌린 이 같은 비아냥거림의 등장 속에 그의 힘이 어쩐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내년 초 사임을 시사한 그린스펀의 예지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린스펀식 해법’으론 해결 안될 만큼 지구촌 경제 현상이 난해해진 연유일까. 어쨌든 그의 시대도 이제 가고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