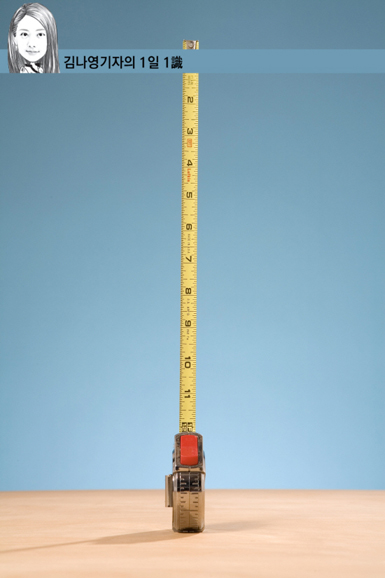|
점점 더 멀어져 간다 /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 내가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 서른 즈음에 (작사, 작곡 : 강승원)
고 김광석씨가 부른 ‘서른 즈음에’는 발표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다. 이 노래의 시적인 가사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멀어져 가는 게 단순히 물리적 거리,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정 지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심리적으로도 청춘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장거리 연애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멀어졌다’는 사실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확장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인간관계의 영역을 4가지로 구분했다. 귓속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 친밀한 거리, 친구와 대화할 때 유지하는 개인적 거리, 업무 회의 또는 인터뷰처럼 공적인 만남에서 두는 사회적 거리, 무대 위 공연자와 객석 간의 거리인 공적 거리다. 이 중에 연인 간의 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 당연히 ‘상대방의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거리(46cm 미만)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바짝 붙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만큼 많은 것을 공유하던 연인이 머나먼 곳으로 떠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거리 체계’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간의 간극이 커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혼동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거리에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존재한다. 심리적 거리만 말 그대로 마음 간의 거리다. 늘 함께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사실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따로 생각하기 힘들다.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전정보 없이도 누가 누구와 일행인지 친한 사이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마주 보고 선 자세, 간격을 보면 답이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가까우면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외로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일이다. 스마트미디어가 발달하고 모바일 SNS가 확산되면서 연인들 간의 소통 빈도도 훨씬 잦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대면 의사소통이나 전화 등의 비중을 줄이고 간단한 문자 기반의 대화만 지속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장거리 연애’가 되어도 매일 소통할 수 있는 무료 전화, 영상통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서로 외로워하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연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신뢰인지도 모른다. 서로의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되리라는 예측 가능성, 안정성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그 관계의 상대방과 함께하면서 스스로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에서처럼 산을 바라보면서, 달을 쳐다보면서도 님을 생각할 만큼의 간절함 만큼이나 강한 ‘믿음’이 있을 때 ‘롱디(long distance)’의 심리적 거리가 극복된다면 너무 구태의연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