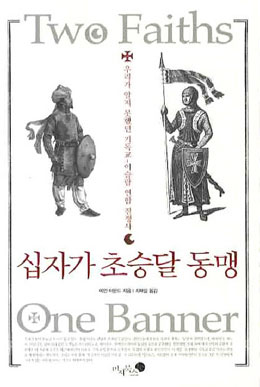|
십자가를 든 기독교와 초승달로 상징되는 이슬람은 항상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있었을까? '문명의 충돌'로 대변되는 이들의 장구한 대립은 과연 역사적 진실일까? 다문화와 다민족으로 이뤄진 11세기 스페인에서는 기독교와 무슬림의 동맹이 흔한 일이었다. 현실 정치와 이해관계에 따른 동맹이었지만 결코 일시적이지 않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한 역사적 일체감이 있었다. 14세기 비잔티움 말기, 황제 칸타쿠제노스와 아이딘투르크 술탄 우무르의 끈끈한 우정이 존재했다. 황제와 술탄은 외교적 관계를 넘어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술탄은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의 외침에서 비잔티움 황제의 영토를 방어해 주었고 내전 때는 군대를 보내 황제를 지원했다. 이에 칸타쿠제노스 황제는 술탄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했으나 "우리는 형제이기에 그런 결혼은 안 된다"는 정중한 사양을 받게 된다. 1297년부터 1461년까지 비잔티움과 세르비아의 공주 34명이 무슬림 통치자와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니 이슬람은 기독교의 형제이자 사위인 나라였다.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 저자는 "이슬람은 비유럽이 아닌 유럽의 일부이자 유럽 문명의 본질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11세기 스페인부터 19세기 러시아까지 유럽사 전반에 걸쳐 존재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연합 전쟁사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알아온 '문명화된 기독교 유럽'이라는 관념을 깨뜨린다. 유럽은 수 세기 동안 여러 종교와 문화가 공존해 온 경계가 불분명한 공간이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유럽(Europe)과 아랍(Arab)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서쪽이나 암흑, 뒤처짐'을 뜻하는 고대 셈어 에레브(ereb)에서 왔다는 주장은 이들이 하나였음을 방증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독교-이슬람 연합 전쟁사'라는 부제와 함께 역사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