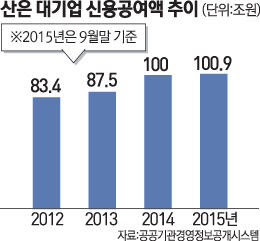|
|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는 조선·해운 같은 경기민감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업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뒤늦게 시작하는 땜질식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각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일괄 기준을 만들어 적신호가 울리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본격화될 수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정책금융기관 수장으로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내정자는 발표가 난 지난 4일 저녁 서울경제신문과 자택에서 단독으로 만나 "조선·해운·철강 등 경기민감형 업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수주량 등을 고려한 취약업종 공통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임하면 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라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그것이 결국 위기산업을 조기에 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업종 공통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은 조선·해운·건설 등 업종별로 부채비율, 수주량, 저가수주 여부, 유동성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핵심 기준을 정한 후 특정 기업의 지표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일종의 상시적용 매뉴얼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해당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이미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내정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았다면 2011년부터 20분기 연속 적자행렬이 이어진 현대상선 같은 기업에도 보다 조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특히 채권단의 땜질식·퍼주기식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지원한 4조5,000억원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10여곳이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순이익에 맞먹는다"면서 "업황이 나쁘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으론 업황이 풀려도 해당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내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일각에서 언급한 '고령'의 느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내정 발표가 난 지난 4일 오후10시30분께 자택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 온 첫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냐"며 "모임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달려왔다"고 전했다. 책상에는 경제기사 스크랩과 각종 메모들이 가득했다. 특히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 이라고 적은 쪽지가 눈에 띄었다. 치열한 노력 없이는 소득도 없다는 평소 소신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였다.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핵심 업무인 구조조정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에 있을 당시 신한캐피탈 적자전환, 동화은행 인수해결반, 홍콩지점 손실 등 험한 일만 맡아왔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험지를 쫓아다녔던 것이 경쟁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신한증권에 갔을 때는 쌍용증권과의 통합으로 4위 증권사가 13위로 추락했고 그것을 다시 4위로 만든 경험을 얘기했다. 그는 "연이익 350억원의 증권사를 재임 기간에 1,500억~2,000억원의 회사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내정자는 2010년 4월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을 마지막으로 거의 6년간 야인(野人)으로 지냈다. 그는 "야인으로 있는 동안 오히려 금융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며 "우리나라가 국부 경쟁력은 10위권이지만 금융경쟁력은 80권인데 조금이라도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은의 위상 강화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내가 입사할 당시 산은은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요즘 산은은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가운데쯤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선도 금융기관의 역할이 아니다. 40년 금융 노하우를 산은 직원들의 기 살리기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의 글로벌 진출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현재 산은은 국내가 90%이고 해외 부문이 10%인 기형적인 구조"라며 "해외지점 인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 사업의 균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친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의 답은 명쾌했다. 이 내정자는 "내가 낙하산이면 KB금융지주나 적어도 친정인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되지 않았겠나. 나는 일생 '신한' 외에는 타이틀이 없었다"면서 껄껄 웃었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