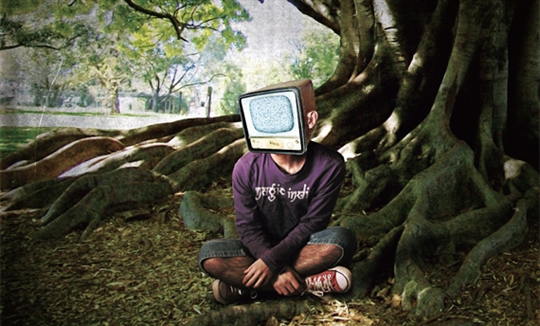자료제공_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과미래
글_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
bluesky-pub@hanmail.net
작년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말 많고 탈 많았던 종합편성 채널(이하 종편)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동아일보의 채널A, 조선일보의 TV조선(CSTV), 중앙일보의 JTBC, 매일 경제신문의 MBN 등 총 4곳이다.
이들 모두는 굴지의 신문사들로 올 12월부터 방송서비스를 공식 개시할 방침을 천명한 상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종편 개국에 의해 국내 미디어 영상 산업 구도에 대대적 변혁이 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지상파와 종편
사실 많은 일반인들은 종편 개국의 의미와 여파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업계 종사자라면 누가 살아남고, 누가 얼마나 광고시장의 파이를 가져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일반 시청자는 그저 SBS와 유사한 TV 채널이 더 늘어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게 상례다.
과연 종편과 지상파, 케이블 TV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지상파는 하나의 채널에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섞여서 편성된다. 반면 케이블 TV는 한 채널에서 오직 한 장르의 프로그램만 방영한다. 예컨대 YTN은 프로그램의 80% 이상이 뉴스며 CGV는 영화, 투니버스는 애니메이션, 디스커버리는 다큐멘터리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전문용어로 전자는 ‘종합 편성’, 후자는 ‘전문 편성’이라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편성 정책을 펴는 것은 시청자층에 따른 시장의 분할과 콘텐츠의 차별화, 전문성 유도 등을 위해서다. 종편은 바로 지상파처럼 장르의 구분 없이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케이블 채널이다. 편성에 있어서는 지상파, 방송 전송은 케이블 채널 혹은 위성 채널과 같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실제로 지상파는 무선전파를 이용한다. 지상의 송신탑을 통해 전송된 방송 신호를 시청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TV로 수신하는 방식의 방송이다. 하지만 종편은 케이블망이나 위성으로만 방송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케이블망은 유선망, 위성은 인공위성을 경유해 위성 접시안테나로 방송을 수신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왜 케이블 TV와 종편을 일반 지상파 TV와 같은 무선전파를 쓰지 못하도록 한 걸까. 이는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는 더욱 그렇다.
한정된 자원, 무한한 자원
이러한 주파수의 용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따른다. 일례로 주파수가 0.3㎒ 이하로 낮은 초장파와 장파는 해상통신, 선박·항공기 항행용 표지통신 및 유도 등 비상용으로 쓰인다. 0.3~800㎒대의 주파수는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이다.
국내의 경우 라디오 방송은 FM 88.1~107.9㎒ 사이에서 100채널, AM 526.5~1606.5㎑ 사이에서 120채널이 운용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지상파가 470~698㎒, 지상파 DMB가 180~186㎒ 및 204~210㎒를 할당받아 사용 중이다. 또 이동통신은 800㎒ 이상을 사용한다. 그리고 3㎓ 이상의 높은 주파수는 우주관측, 군사용 레이더 등 특수 용도에만 활용하고 있다.
즉 한정된 전파를 국가로부터 제한적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는 만큼 지상파 채널의 수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지상파는 EBS를 포함해 총 5개 채널로서 시청자들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는 가구당 2,500원의 시청료만 내면 추가 부담 없이 쉽게 방송을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최대 장점이다.
물론 지상파는 이 같은 대중적 노출의 용이성에 상응해 규제도 많다. 방송시간이 하루 최대 19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며 장르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편성이 강제된다. 방송 가능 언어나 신체 노출 수준의 규제 역시 케이블에 비해 엄격하다.
이와 달리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채널 확대에 매우 유연하다. 유선망과 인공위성을 늘리면 된다. 현재도 동축케이블 하나로 약 50채널, 광케이블은 약 100채널의 방송 송신이 가능하다. 풍부한 채널 운용능력을 십분 살려 다수 대중이 아닌 특정 소수의 수요에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종편을 포함한 비(非) 지상파 방송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채널이다. 원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므로 방송 내용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24시간 종일방송이 가능하며 의무편성 비율도 낮다. 또 지상파에서는 보기 힘든 막말이나 수위 높은 노출이 허용된다.
제4의 지상파
지상파와 비 지상파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중간광고다. 비 지상파 채널에서는 지상파는 금지된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시청자는 다소 짜증스러울 수 있어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수익증대를 모색할 수 있다. 지상파와 달리 광고 매출액의 3~4% 수준인 방송발전기금 납부 의무도 없다.
특히 이번 종편 도입은 단지 방송 채널 몇 개를 늘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다. 원래 케이블 채널은 방송을 직접 송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지상파는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제작, 편성, 최종 송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그러나 케이블 채널은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만 허용될 뿐 각 가정에 방송을 팔고 공급하는 것은 지역별 유선방송 사업자(SO)의 몫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케이블 채널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SO가 송출해주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돼 있는 100개가 넘는 SO들과 일일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바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종편은 '의무전송채널'로 규정됐다. 모든 SO가 의무적으로 종편을 송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익채널이 아닌 종편을 의무종편 채널에 포함시킨 이유는 후발 신규사업자의 시장 연착륙을 도와주기 위한 배려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체 시청 가구의 4분의 3에 달하는 1,500만 가구에 이른다. 이 정도면 대중적 영향력이 지상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 종편을 '제4의 지상파'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종합편성, 중간 광고, 의무전송 등을 지적하며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커다란 변혁
그래서일까. 모든 종편은 새로운 SBS가 되기를 꿈꾼다. 신문 산업의 위축으로 새로운 미디어 산업 진출을 꾀하고 있던 신문사들은 더하다. 이들의 꿈대로 종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올 12월 종편이 출범하면 국내 미디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지상파가 독·과점 해왔던 국내 방송의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4개의 종편 채널이 가세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종편 채널들의 재정적 기반이 될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두개 정도라면 모를까, 한번에 4개나 종편이 생겨서는 자칫 '제로섬 게임'처럼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은 사업자가 나눠가지면서 전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사실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2002년 이후 정체 내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갑론을박을 차치하면 국내 방송시장에 대대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만일 종편이 제대로 시장경쟁에 노출되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 IT 기술, 디지털 기술이 꽃피우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10년쯤 뒤 종편이 지상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두세 곳의 사업자가 정리되고 최강자 하나만 살아남아 지상파와 경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종편의 흥망성쇠는 결국 사업자의 능력과 그들의 프로그램을 지켜볼 시청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큰 실언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