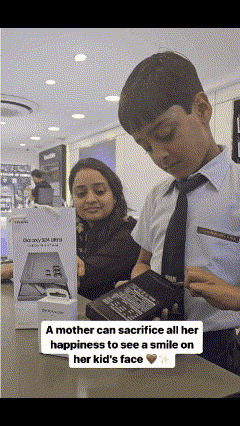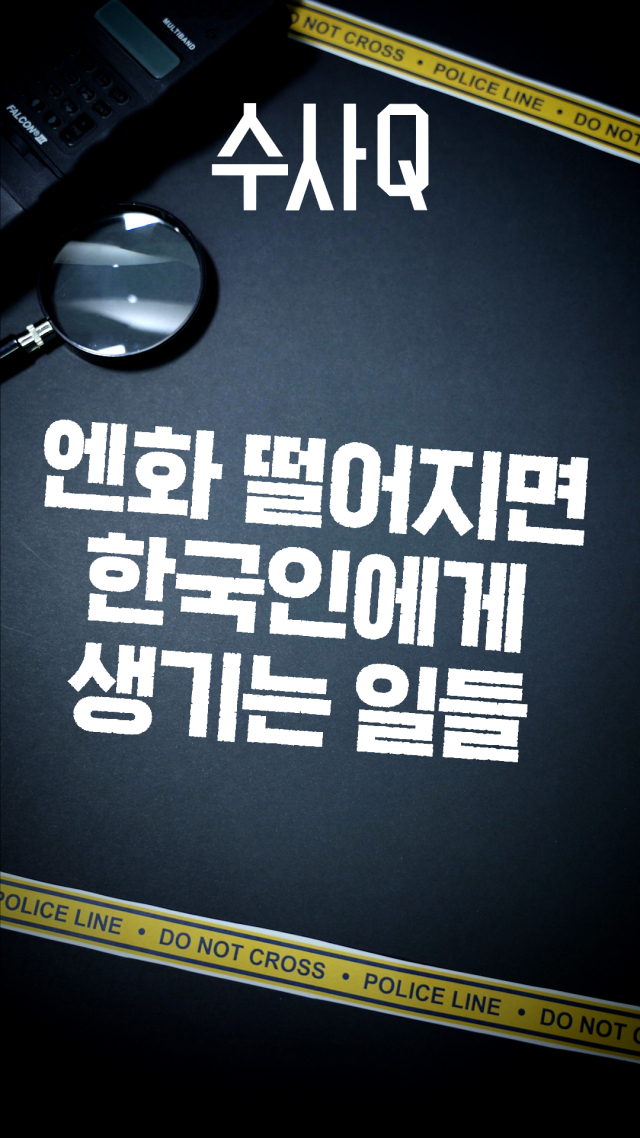|
2014년 세밑에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닥쳐올 위기를 감지하고 사업을 재조정한다고 한다. 선택과 집중은 기업 전략의 기본이자 필수다.
그러나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속도 이상으로 글로벌 경제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발주자의 이점이 소멸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자랑하는 속도경영의 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위기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IMF 사태 3년 전 시장개방때와 비슷
새로운 경영환경에서는 핵심역량을 갈고 닦는다고 경쟁력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우수한 역량을 가졌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세계 최고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량축적의 시대에서 기회추구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빠르게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 역량에만 의존해서는 새로운 시장은커녕 기존 시장도 중국의 경쟁기업들에 내줄 판이다.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발굴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2014년의 한국 경제를 보면 정확히 20년 전인 지난 1994년 근처의 여러 모습이 데자뷔처럼 나타난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우루과이라운드로 상징되는 시장개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불행히도 서해 페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한다. 1994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 준 지존파가 체포됐다. 그리고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에 이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이때 정보화촉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정보화 시대 돌입을 공식화한다.
이 당시 각종 미디어에서는 시장 개방화에 맞선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이 주된 기삿거리였다. 한마디로 '아무 준비 없이 국내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라도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IMF 경제위기라는 쇼크에 30대 재벌기업 중 14개가 도산했다. 정보화 구조전환에 머뭇거리던 회사들이 줄도산한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요즈음 미디어들은 '선발주자(first mover)가 되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정책 수립과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양적완화 종식, 해외발 금융위기, 엔저현상,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 수시로 등장하는 위기설에 마치 언제라도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끈기와 정성으로 새 틈새 찾아내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업들은 새로운 요구에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설마 그렇게 되기야 하겠나?' '그래도 수십년을 버텨왔는데…'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줄도산의 위기상황이 불과 20년 전 우리의 현실이었고 앞으로의 경제환경도 우리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위기 뒤에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 기회는 글로벌 세상에서 끈기와 정성으로 새로운 틈새를 찾아내는 기업들에 먼저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