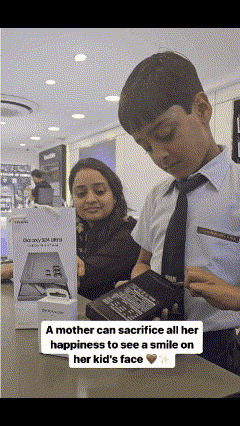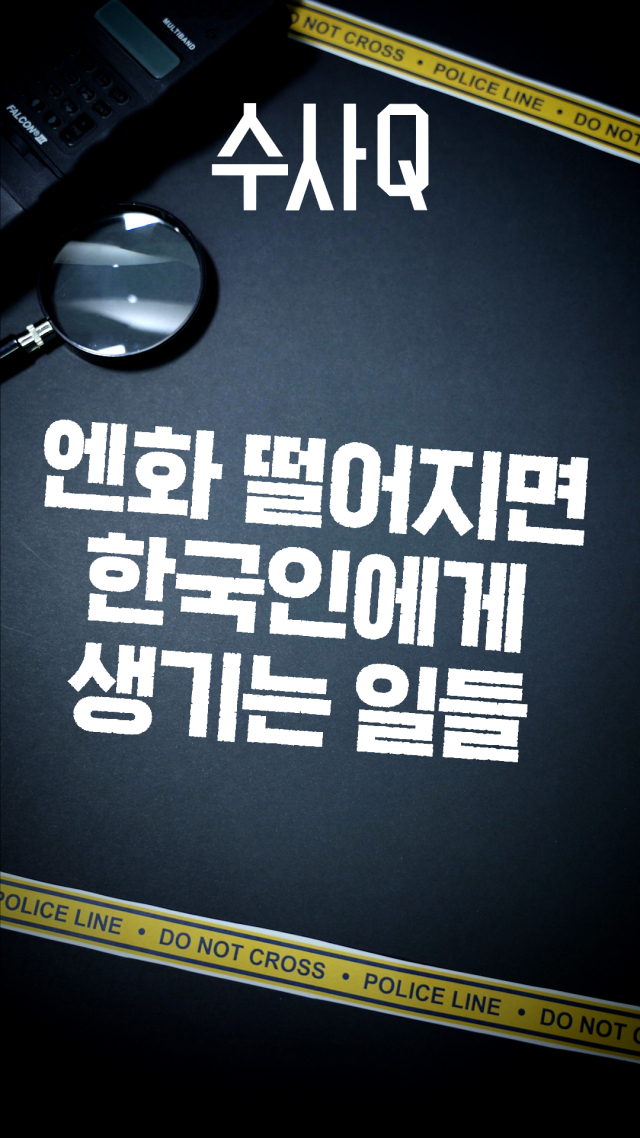|
지난해 이맘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부패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설문 대상자 중 일반인과 기업인의 54%·35% 정도가 공직자에 대해 '부패하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고작 4%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정당·입법·언론·교육 등 11개 사회 분야 가운데 행정기관의 청렴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600명에 이른다는 정부 집계나 올해도 어김없이 세월호 참사, 방산비리 등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공무원들의 설문 결과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굳이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가 공무원의 부패보다 훨씬 심하다고 여기는 일종의 자기방어 심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부정청탁, 공직자의 부패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자기합리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심리와 이중잣대가 공직사회 연대감과 맞물리면 더욱 견고한 부패 카르텔을 만든다. 관피아·군피아처럼 집단 간 부정 결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공생하는 이른바 엘리트 카르텔도 같은 맥락이다.
부패를 바라보는 인식의 괴리를 줄이려면 결국 같은 지향점과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해법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 잣대다. 법 적용 대상자와 부정청탁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에서는 돈을 받은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혈족 등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면 전 국민 가운데 1,500만명 이상이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이지 전 국민이 아니다. 사실 아무런 대가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선물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절대 다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대상을 부풀리는 것은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다. 이미 여러 예외조항과 처벌규정을 완화한 수정안까지 나와 입법 취지가 사라진 빈 껍데기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정치권이 시간 끌기와 물타기를 멈추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선 법을 통과시키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참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력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때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부패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더욱 벌어질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