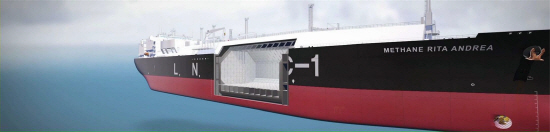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당 100억원의 로열티를 아낄 수 있는 한국형 화물창(LNG 저장공간) ‘KC-1’이 지난해 개발됐지만 신제품을 못 미더워하는 선주사와 기존 제품에 익숙해진 조선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개발 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KC-1 확산을 위해 내년 2월께 국내 대형 조선 3사와 설계 합작사를 설립하고 해외 선주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조선·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SK E&S는 2019년부터 미국 셰일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8만㎥급 LNG선 2~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한국 선주가 LNG선을 발주하는 사례가 드물어 이번 입찰은 시작 전부터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어떤 업체가 수주할 지 여부와 함께 KC-1 채택 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SK E&S가 지난 9월 제시한 LNG선 화물창 사양이 프랑스 엔지니어링사 GTT가 설계한 8각 모양의 멤브레인형으로 제한되면서 가스공사와 KC-1 관련 업체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최건형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박사는 “KC-1이 트랙 레코드(건조 실적)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국내외 선급의 안정성 검토를 통과했고 재료·시공비도 아낄 수 있지만 선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LNG선은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162℃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다. 화물창은 이런 초저온의 LNG를 견뎌내면서 단열 기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집약돼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대부분의 LNG선이 GTT가 고안한 화물창을 채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GTT가 국내 조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로열티 수입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가스공사와 조선업체들은 지난 2004년부터 10여년 간의 기술 개발 끝에 지난해 KC-1을 만들었지만 국내외 선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개점 휴업’인 상태다.
여기에 조선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중공업만 KC-1 형태의 LNG선 건조를 위한 사전 투자를 한 점도 확산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새로운 형태의 배를 지으려면 족장(발판·통로)도 새로 만들고 직원 교육도 다시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KC-1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KC-1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나 선주들과의 미팅에서 화물창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내년 2월 중순에는 조선 빅3와 KC-1 설계 전문 합작회사도 설립한다. 특히 건설 중인 제주 애월항 LNG 인수기지와 경남 통영기지를 오가는 9,000㎥ LNG선 2척도 KC-1 형태로 발주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국내 조선·해운업계와 화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