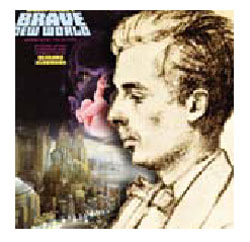|
‘가난이나 질병, 전혀 없다. 오로지 행복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평생을 젊은 모습으로 살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사회적 갈등이나 계층 간 불화도 발생할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계급에 만족하고 사니까.’ 이런 곳이 존재할까. 있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ryㆍ1894.7.26~1963.11.22)의 1932년 출간작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라는 허구 속이지만. ‘멋진 신세계’에는 출산의 고통마저 없다. 인공수정된 태아가 유리병 속의 기계적 환경에서 자라나고 날 때부터 적성과 지능ㆍ유전자에 따라 계급이 정해진다. 최상위인 알파계급은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최하층인 엡실론계급은 청소 같은 잡일을 맡는다. 철저한 계급사회라도 불만이나 갈등이 전혀 없다. 모두가 자기 일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무제한 허용되는 섹스도 싫증나면 행복을 보장하는 알약(소마)를 먹으면 그만이다. 헉슬리는 왜 이런 사회에 ‘멋진 신세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반어법(反語法)이 깔려 있다. 인간의 욕망과 산업발전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를 미래 풍자소설에 담은 셈이다. ‘멋진 신세계’의 시대적 배경은 AF(after Ford) 632년. 대량생산 시대를 연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시간의 출발점이다. 수편의 영화 소재로도 사용된 ‘멋진 신세계’는 상상의 영역에 머물고 있을까. 글쎄다.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풍토와 헉슬리의 우려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발칙한 한국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펴냈던 미국인 문화비평가 스콧 버거슨의 말을 들어보자. “북한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처럼 공포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라면 남한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