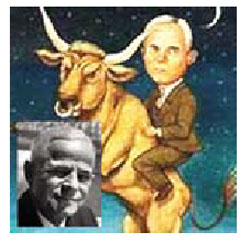|
‘혼탁 그 자체다. 무법천지인 월가의 증권 브로커는 가족까지 등쳐먹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혁으로 구악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대중의 눈에 증시는 음험한 곳으로만 비쳤다.’ 월가 역사가인 존스틸 고든이 지은 ‘월스트리트 제국’의 일부다. 야바위꾼의 이전투구장 같던 월스트리트를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킨 주인공은 찰스 메릴(Charles E Merrill). 1885년 10월19일 플로리다에서 가난한 시골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대학 재학 중인 22세 때 월가와 인연을 맺었다. 특유의 붙임성으로 고객을 확보한 그는 1914년 증권 브로커 사무실을 열고 이듬해에는 채권전문 브로커인 에드먼드 린치와 합병, 대형 사무실을 차렸다. 세계 2위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출발점이다. 메릴의 주요 투자 종목은 크레기(오늘날 K마트), J C 페니 같은 체인점. 1920년대 호황을 타고 급성장하던 메릴은 1929년 가을 증시가 이상 과열됐다는 판단 아래 주식은 물론 거래소 회원권마저 팔아치웠다. 덕분에 대공황에서도 재산을 지켰다. 증시에 다시 돌아온 것은 1940년. 본격적인 개혁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조사기능과 매매업무를 분리하고 중개인들에게 고정급을 주기 시작했다.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체인점을 본떠 전국에 수많은 지점도 열었다. ‘증권사’라는 명칭도 이때부터 쓰였다. 증권 브로커와 증권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메릴이다. 윤리경영과 전국 지점망, 대대적인 광고는 투자인구를 늘렸다. 미국 세대주의 16%에 머물던 주식투자 인구가 메릴이 사망한 1956년에는 50%로 늘어났다. 오늘날 증시가 일반인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자리잡은 데는 주식 대중화라는 그의 업적이 녹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