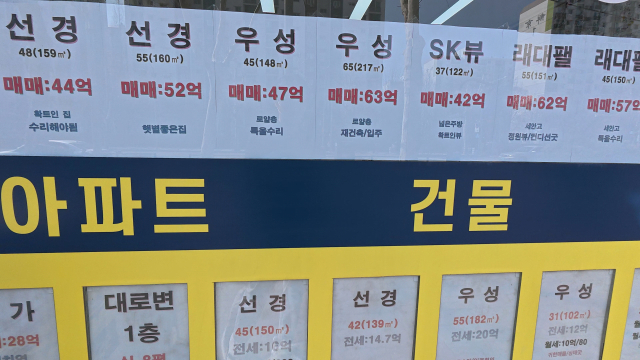◎국제환경협상 맡을 전문가 절대 부족/타결 막바지 허둥대는 구태답습 일쑤/「지구기획단」 등 부처협의체 복원부터『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를 앞두고 가동됐던 지구환경기획단과 같은 부처간 상설협의체를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제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외무부 국제경제국 관계자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산업구조 조정, 생명공학산업 육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다자간 환경협정 협상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상설협의체 구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환경목적의 무역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수용하자는 「환경라운드」에 어떻게 대처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노력에 언제, 어떤 수준에서 동참할 것인가 등 다양한 국제환경이슈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한두개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자간 환경협정을 사실상 좌우하는 「이너 서클」 등에 끼어 협상을 우리 입맛에 맞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협상 참가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외무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들이 국제환경전문가를 키우는데 인색해 다자간 환경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협상을 우리 입맛에 맞게 끌고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국내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국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자간 환경협정이 타결될 막바지에 가서야 허둥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는다.
물론 해박한 지식과 협상능력으로 국제적인 지명도를 갖는 환경외교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대표부 등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환경업무를 다뤄온 정래권유엔대표부, 최석영 제네바대표부참사관 등이 그들. 하지만 이들은 예외적인 존재에 속한다.
특히 환경관련 부처들의 전문성 및 인식부족은 「환경외교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다.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대처방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전문가와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간 무대인 환경회의의 특성상 협정을 이끌어내는데 수년이 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정무·통상분야에 비해 고위층의 관심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