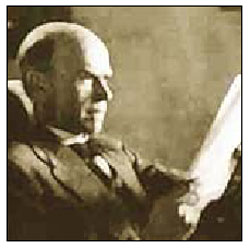|
연구자들이 고개를 저었다. 방향을 잡기 어려워서다. 무대는 1924년 AT&T사의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 호손(Hawthorne) 공장. 작업환경 개선이 생산성을 올려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연구팀은 먼저 작업장의 조명을 밝게 바꿨다. 예상대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비교집단에서도 비슷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는 점. 난관에 봉착한 연구팀은 1927년 전문가를 불렀다. 초빙자는 엘턴 메이오(Elton Mayo)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메이오팀은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확대, 간식 제공 등 노동여건을 개선시켰다. 예측대로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뜻밖의 결과도 나왔다. 노동조건을 원래대로 돌렸을 때 역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메이오는 실험의 주역으로 선발됐다는 여공들의 자부심이 어떤 경우에서도 고효율을 낳은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32년까지 연구를 진행한 메이오팀은 이듬해 ‘산업화와 인간관계론’을 펴냈다. 종업원의 소속감과 안정감ㆍ참여의식이 생산성을 결정하고 인간관계로 형성된 사내 비공식조직이 경영성과를 좌우한다는 메이오의 주장은 파장을 일으켰다.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와 포드식 대량 생산, 기계화와 자동화가 경영신앙으로 자리잡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마침 대공황의 복판이어서 노동자를 중시한 연구결과는 더 큰 호응을 받고 생산성 혁신사의 전환점을 그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생(1880년)으로 의대 중퇴, 잡지 기고자를 거쳐 뒤늦게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해 산업현장과 경영에 접목한 메이오는 1947년 은퇴한 뒤 1949년 9월7일 69세로 죽었지만 산업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남겼다. 기계에 딸린 생산재로 여겨지던 인간이 경영관리의 중심으로 대우 받게 된 것도 그의 연구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