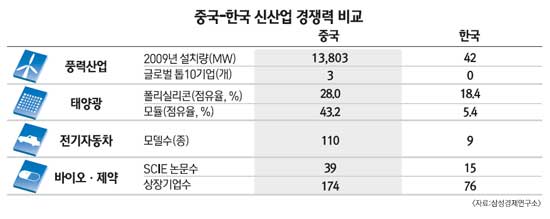[투자가 산업강국 만든다]<br>기아차·현대석유화학, 대규모 설비투자 했다가 외환위기 못견디고 쓰러져<br>현대차·LG에 인수된 후 글로벌기업 도약 밑거름
IMF 외환위기 직후 불경기와 설비 과잉으로 석유화학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던 지난 2000년. 불황을 견디다 못한 현대석유화학이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있는 연산 22만톤 규모의 폴리염화비닐(PVC) 공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 공장은 설비 확충을 원하던 LG화학의 품에 안겼다. 결국 2003년 현대석유화학은 정부가 주도한 사업교환(빅딜)으로 산업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 회사의 PVC 공장은 LG화학의 핵심 PVC 라인으로 탈바꿈해 지금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LG화학이 석유화학 분야의 글로벌 절대강자가 된 것은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꾸준히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탁월한 경영능력 덕임은 부인할 수 없다. 만약 석유화학업계가 대규모 투자로 탄탄하게 구축해놓은 생산설비 인프라가 없었다면 LG화학의 성장속도는 달랐을 게 분명하다.
석유화학업계의 역사는 비록 설비투자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설비는 남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동차ㆍ조선ㆍ기계 등도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과거 설비투자의 남겨진 유산이 얼마나 값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1990년대 들어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생존 제1법칙은 '큰 게 아름답다'는 대형화였다. 전세계 수십여개의 자동차회사들이 10개 이하의 거대 자동차회사로 재편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줄을 잇던 시기였다. 한국에는 현대자동차ㆍ대우자동차ㆍ쌍용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20여년 뒤 한국 자동차업계는 '글로벌 빅5'로 일취월장한 현대ㆍ기아차가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GMㆍ포드 등의 아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 이면에는 현대차가 1998년 부도난 기아차를 사들여 연산 58만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단박에 확보한 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8년 48만889대였던 기아차의 판매대수는 이미 넘치도록 투자해놓은 생산설비에다 현대차의 경영 노하우가 접목되자 1년 만에 85만5,700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기아차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1,3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쾌속질주를 이어간 기아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213만대의 자동차를 팔아 매출액 23조4,600억원, 순이익 2조2,500억원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의 성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당시 3공장까지 투자해 설비를 갖췄던 화성공장이 밑바탕이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한국 산업계의 역사는 험난한 구조조정의 여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세계의 모든 산업은 투자 확대→구조조정→안정화→투자 확대 등의 사이클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기업의 흥망성쇠 역시 남겨진 설비투자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거나 새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설비경쟁에서 승리하느냐에 좌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