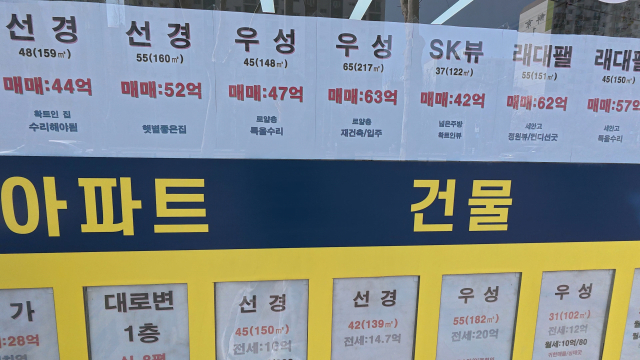국제통화기금(IMF)체제 원년으로 기록될 무인년(戊寅年) 한해는 부동산 시장 질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렸던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가격 폭락사태를 겪었고 이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졌던 신화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제도 변화 또한 과거 10여년간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이에 본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주택부문, 토지및 기타부문 등 두차례로 나눠 결산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깡통주택」 「전세대란」
올 한해동안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유행어들이다.
유례없는 집값 폭락과 거래 마비로 시장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줄을 이었다.
◇집값 폭락=집값 하락은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월부터 11월말까지 월별 주택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집값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왔다. 집값 흐름을 주도하는 서울도 예외는 아니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6.7%가 떨어지는 등 8월을 제외하고는 가격하락세가 계속됐다.
전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1월에 1%가 떨어진 이후 こ2월 2.4% こ3월 4.1%こ4월 5.5% 등으로 하락폭이 점점 커졌다. 8~9월 사이에만 잠시 반등세를 보였을 뿐이다.
연말 들어 소폭이나마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 때문에 내년에 집값이 회복될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집값 하락은 주택가격의 거품을 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걸친 집값 폭락은 자칫 주택산업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거래마비=집값 하락은 곧 거래 마비를 일으켰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집값이 올라가야 수요가 생기는데 오히려 떨어지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 수 밖에 없다.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신화가 깨져버린 셈이다. 더욱이 IMF체제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신규 분양은 물론 집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조차 무더기로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세값이 떨어지자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보증금 반환문제로 법정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심지어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깡통주택」까지 등장해 「집가진게 죄」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정부는 이처럼 전세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자 올초 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주택공급 위축=주택수요 감소는 곧 신규 공급 감소와 이에따른 업계의 연쇄도산을 불러왔다.
올들어 10월말까지 건교부가 집계한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 물량은 총 22만9,856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6만3,765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공급물량은 예년의 60% 수준을 유지했지만 민간 주택업체는 지난해(30만8,877)의 45.2%에 불과한 13만9,472가구를 지었을 뿐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물량은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공급물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10월말 현재 10만6,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분양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 대출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10조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점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셈이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