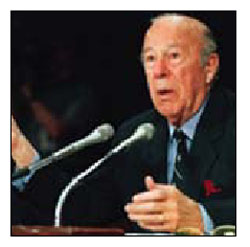|
1982년 9월30일 유엔총회.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이 목청을 높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발도상국의 채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개도국들도 서구의 입맛에 맞는 수출품을 내놓아야 하며 자유무역만이 살 길이다.’ 슐츠 발언의 배경은 제3세계의 외채 증가. 1970년대 중후반까지 1,300억~1,900억달러를 오가던 개도국의 채무 총액이 1982년 6,120억달러로 뛰자 내놓은 처방이다. 개도국들은 즉각 반발했다. 영국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이자가 급증하고 국제자금이 금융권으로 빠져나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채무 재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슐츠 선언 바로 다음날 멕시코의 포르티요 대통령은 ‘이미 3배로 올라버린 이자비용 증가분은 채권국에도 책임이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경우 개도국의 힘을 합해 집단적인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겠다’며 맞섰다. 저항은 통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포르티요는 집단행동을 위한 힘을 모으기도 전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저항의 구심점을 잃은 개도국들이 1980~1986년 중 상환한 외채는 6,580억달러.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갔음에도 1조3,000억달러라는 연체금액이 남았다. 결국 라틴아메리카는 연쇄적인 국가부도에 휘말려 IMF의 관리 아래 수도와 전기ㆍ석유ㆍ천연가스와 은행 등 국영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겼다. 슐츠 선언은 개도국을 향해 재산정리 절차를 알리는 포고문이었던 셈이다. 한국도 굴곡을 겪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평화상을 수상(1992년)한 슐츠가 일찌감치 제안한 대로 IMF 구제금융도 받았다. 슐츠가 지키려 했던 국제금융질서도 요즘은 혼란 그 자체다. 슐츠가 신념처럼 전도한 신자유주의도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