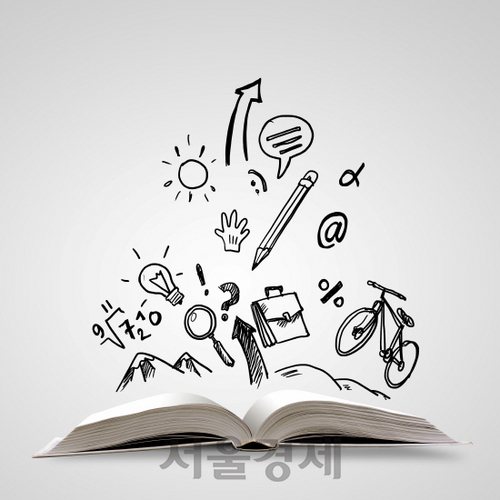|
인문학 열풍이라고 하지만 원전을 읽는 이는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교과과정에는 ‘명저 읽기’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동서양의 문학, 철학, 사학과 관련된 고전을 읽고 비평하는 일종의 사고력 기르기 수업입니다. 내용 자체는 의미 있고 재미도 있었지만 교수법은 고등학교 시절 국어나 문학을 가르치던 방법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기존 논문에서 이야기했을 법한 작중 인물에 대한 관점, 이야기 속에 숨어 있었을 복층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암기해 가며 중간,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면 노트는 후배에게 대물림되거나 똑똑한 ‘구매자’에게 꽤 괜찮은 값에 판매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보내면서 명저로부터 얻은 통찰은 온데간데 없고 지극히 일상적인 고민만이 머릿속에 남아 덧없는 대학 생활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을 읽고 공자를 읽으면 마음 속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자기경영 전문가가 썼던 ‘성공을 위한 습관’ 같은 책은 더 이상 보지 말고 동서고금의 고전에서 삶의 지혜를 빌리라는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전을 볼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굳이 어려운 원문을 해석하는 고통스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고전이 말하는 일상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고전을 일반 대중의 관점에 맞게 풀어주는 동시에 심리 상담가 역할까지 하는 인문학 멘토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대체로 이런 흐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 멘토’ 대부분이 기존 인문학계의 아성을 차지하고 있던 학자들이 아니라 비평가, 소설가, ‘활동하는 인문학자’, 즉 재야에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1980~1990년대 역사학계에서 재야 사학과 강단 사학 간의 대결이 학생들의 관점을 양분했듯, 기존의 관점과 해석을 대물림해 온 전문가들과 나름대로 생태계 주변부에서 자기만의 렌즈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두 세력은 좀처럼 협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전문 연구자들은 ‘인문학 진흥 사업’을 통해 꾸준히 학문적 엄정성과 삶의 실용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고 싶어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반면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이들은 인문학 멘토링이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켰는가, 작가들의 인세와 강연료를 늘리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가 있었는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 때문일까요. 양 진영이 생산한 성과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가도 살아 남을만한 콘텐츠가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리와 풀이는 일종의 권력입니다.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입니다. 신출내기 연구자는 이런저런 인용을 달고 참고문헌을 제시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용감하고 당당한 전문가들은 이렇다 할만한 선행 문헌의 근거가 없이 ‘미네르바의 부엉이’ 같은 엄청난 말들을 글에서 쏟아 내기도 합니다. 데뷔 시절의 알랭 드 보통이나 아사다 아키라 같은 선진국 인문학 멘토들이 그랬죠. 재미있게도 이들은 강단과 재야 양 세력에서 모두 환영받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인문학 트렌드의 이름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사람들이 앞으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들의 정리와 풀이가 충분히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냥 ‘쉬운 인문학’이면 곤란하겠죠.
/iluvny2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