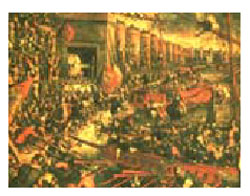|
1453년 5월29일 여명. 3중 성채를 자랑하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뚫렸다. 튀르크군에 포위된 지 50일 만이다. 1,128년 간 그리스ㆍ로마 문명을 간직해온 비잔틴제국도 숨을 거뒀다. 광대했던 영역이 쪼그라들며 콘스탄티노풀 하나만 달랑 남아 자유무역항으로 전락했지만 난공불락이라던 성벽은 왜 무너졌을까. 병력 차이 17만 대 7,000여명이었지만 예전에도 수차례나 비슷한 열세를 딛고 방어에 성공했는데, 왜. 콘스탄티노플은 안에서 무너졌다. 부유층과 대신들의 자식들이 병역을 기피하고자 대거 외국 유학과 이민을 떠나고 무역 목적으로 거주하던 베네치아와 제노아인도 서로 반목했다. 과학기술 경시 풍토도 망국을 거들었다. 포신 8.2m짜리 ‘튀르크 대포’의 제작자 헝가리인 우르반을 콘스탄티노플에서 내친 결과가 609㎏ 포탄으로 되돌아오며 성벽을 깨뜨렸다. 비잔틴제국과 동로마의 멸망은 역사의 반전을 낳았다. 오스만튀르크의 등장으로 향료와 도자기의 육로 수입길이 끊긴 상인들은 뱃길을 찾아 나섰다. 서양을 세계사의 중심에 올린 대항해시대가 이렇게 열렸다. 콘스탄티노플을 탈출한 학자들도 르네상스에 불을 붙였다. 망명 비잔틴 학자들이 갖고 온 고대 그리스ㆍ로마 고전의 번역판은 때마침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맞물려 지식을 빠르게 전파시켰다. 튀르크의 대포에 놀란 각국은 총포와 화약 연구에 몰두했다. 튀르크 예니체리군단(기독교 노예로 구성된 상비군)을 모방한 상비군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제왕권이 싹트고 유럽은 근대로 접어들었다. 이슬람과 동양에 대한 기독교의 보호막이던 콘스탄티노플의 최후가 서구의 발전을 자극한 셈이다. 1453년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서구가 독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전과 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