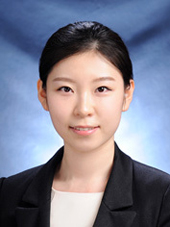|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따라 만든 게 아닙니다."
얼마 전 기자에게 한 통의 e메일이 도착했다. 요지는 한 개발자가 만든 보상형 애플리케이션 소개.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보낸 사람의 억울한 말투가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미 출시된 타 개발자의 앱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절대 따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5월 정부 지원의 청년창업 사업에 발탁돼 앱을 기획했지만 진행이 느려져 타 개발자보다 늦게 출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는 자신이 먼저라는 다소 황당한 얘기다.
개발자의 사정은 나름 딱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비슷한 앱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가 만든 앱은 구성과 방법에서 기존의 보상형 앱과 다를 게 없다. 이 같은 보상형 앱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100여개, 구글 플레이에 270여개 등록돼 있다. 이중 지난달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00위 안에 드는 앱은 3개에 불과하다. 하루 이용자 수(DAU) 100만명을 넘는 것도 단 하나뿐이다. 취재를 위해 지난 6개월간 보상형 앱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특정 앱이 인기를 끌자 여러 비슷한 앱들이 따라 생겨났고 일부를 제외하곤 다시 사라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쉬워도 너무 쉬운 앱 개발환경 때문에 발생했다. 한 개발자는 "1년에 30개의 앱을 만들었다"며 "사실상 앱 자체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이 없어도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앱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앱을 만들 수 있다. 개발한 앱을 출시하는 것도 쉽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애플과 달리 폐쇄적이지 않아 특별한 심사 없이 누구나 개발한 앱을 등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모방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모방앱은 기존에 출시된 앱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대다수는 실패하고 사라진다. 이러한 모방앱은 앱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앱 개발을 장려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앱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