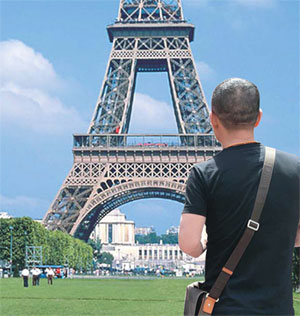|
2014년 새 달력을 받은 10년차 직장인 김모(39)씨. 그는 달력을 펼쳐 빨간 날인 일요일과 공휴일부터 확인했다. 내년 빨간 날은 67일. 올해(66일)보다 하루가 더 있다. 이는 지난 2002년(67일)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주5일제를 감안해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토요일(50일)까지 포함하면 모두 117일을 쉬게 된다. 역시 올해(116일)보다 하루가 많다.
하루가 어디냐. 특히 김씨는 올해 10년 장기근속으로 일주일을 더 쉬게 돼 기존 2주 휴가와 합쳐 휴일이 더 늘어난다. 너무 많이 노는 것은 아닌가. 김씨는 반박한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심신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면서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회사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산되는 리프레시 휴가=2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가거나 연차를 일주일 이상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리프레시(refresh)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리프레시 제도는 근무 분위기가 자유로운 일부 정보기술(IT) 및 외국계 기업의 실험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제조ㆍ건설ㆍ금융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평균 1~2개월 휴가를 가는 일반적 서구 국가들을 따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 또 다국적화되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04년 주5일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생산성이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국제적인 노동조건을 지킨다는 평가로 오히려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글로벌스탠더드의 경우 두산그룹이 대표적인 예다. 두산그룹은 전체 직원(약 4만명)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데다 30여개국 110여개사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2011년 리프레시 휴가제도를 도입한 후 박용만 회장부터 지난해 2주간 여름휴가를 떠나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오르는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소속팀 두산베어스가 진출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직관(직접 관람)'하는 등 여전히 의욕을 보였다.
이와 함께 GS칼텍스와 GS건설ㆍ제일기획 등도 연차휴가를 붙여 2주 이상 최장 2개월까지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GS칼텍스는 팀장급이 2주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정 근속연수에 도달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안식월'이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이나 기업들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SK텔레콤은 10년차와 20년차 근속직원들에게 각각 45일씩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이 기간에 학원 등을 다니며 재학습에 나설 경우 학원비도 지원한다. 넥슨 역시 기존의 휴가일수에다 3년ㆍ6년차에게 각각 10일, 9년차에게 20일을 덧붙여 휴가를 주고 있다. 옥션도 5년 단위로 근속기간을 채울 경우 한달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휴가기간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해 회사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구글은 'VTO(Volunteer Time off)제도'를 통해 전직원이 자원봉사를 위한 5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에서는 SC은행이 연간 2일의 유급 '자원봉사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휴가 정착을 위해선 조직이 바뀌어야=물론 장기휴가를 도입한 곳은 아직 일부 대기업이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연차휴가가 짧은데다 실제 부여한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난이 주된 핑계거리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직장인 3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은 연차유급휴가로 18.0일을 줬지만 50인 미만의 기업은 13.1일로 5일 정도 차이를 보였다.
결국 장기휴가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의 엄격한 적용 및 경영인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휴가를 개인적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기업은 신한은행과 에쓰오일이다. 이 두 회사는 2주간의 리프레시 휴가를 의무화했다. 특이한 점은 직원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생기는 업무공백을 '십시일반' 식으로 주변에서 분담하는 방법이 아니라 '대행체제'를 도입해 시스템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대행업무를 위해 때때로 업무분장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부서의 직원을 휴가자의 부서로 임시 파견하기도 한다. 신입사원 채용을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사례가 참조할 만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월 여름휴가로 9일 동안 수도를 비웠다. 이집트 유혈시위 등 중동사태가 심각해지고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사찰 논란으로 국내외가 혼란스러울 때였다. 84억원짜리 리조트에 묵는 등 초호화 휴가라는 비판은 있었지만 '휴가' 그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적었다. 더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웠는데도 행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휴가를 포기한 직장인 700명에게 이유를 조사했는데 '회사 내 휴가 시스템 미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직장인이 23.5%였다. 또 '업무상 이유'가 19%, '회사 내 사정'이 13.1%를 각각 차지했다. 즉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이유로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전체의 3분의2에 가까웠다.
휴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휴가를 휴식 및 여가시간을 활용해 피로를 푸는 리프레시로 삼고 나아가 창의력을 배양하고 자기개발 및 업무전문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운영의 시스템화ㆍ매뉴얼화와 업무 투명성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