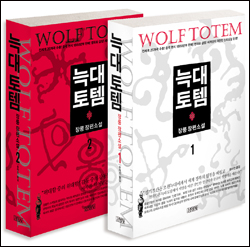홈
사회
사회일반
"몽골 승승장구 비결은 늑대병법"
입력2008.07.25 17:15:29
수정
2008.07.25 17:15:29
■늑대토템 ■장룽 지음, 김영사 펴냄<br>中 '지식청년' 내몽골 경험에서 쓴 자전소설<br>자연과 조화 중시하는 유목민족 문화 보여줘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까지 진출한 칭기즈칸의 몽골. 그들이 전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한족 출신으로 내몽골에서 10여 년동안 생활한 저자는 “몽골인들이 초원의 사냥꾼 늑대와 맞부딪치면서 전투, 유격전, 기습전에 능수능란한 늑대병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초원민족들은 늑대로부터 배운 전술을 사용해서 이웃 농경민족들과 싸웠지. 손자병법과 늑대병법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군.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지피지기(知彼知己), 군사행동은 신속해야 한다는 병귀신속(兵貴神速)… 이것들은 다들 늑대의 주특기이자, 늑대라면 다들 할 수 있는 것들이지.’(178쪽)
두 권으로 구성된 책은 1967년 지식청년(도시인구를 줄이고 농촌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정책적으로 농촌에 이주시킨 도시학생)으로 내몽골 변경 올론초원에서 생활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이다. 저자는 몽골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늑대와 직접 싸우고 새끼 늑대를 키웠던 경험을 토대로 ‘늑대정신’과 ‘늑대병법’을 소설로 풀어놓았다. 2004년 출간돼 중국에서 240만 부 이상 판매됐고 2007년 ‘맨그룹(Man Group)’ 주최하는 ‘맨 아시아 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저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지식청년 ‘천전’은 정신적 스승인 빌게 노인을 통해 유목민족의 문화를 배운다. 초원에서 양과 말을 키우는 몽골인에게 늑대는 숭배의 존재이면서 한편 배척의 대상이었다. 몽골인들이 늑대를 떠받드는 토테미즘은 소설 속 다양한 사건을 통해 형상화된다. 초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늑대의 공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천전. 그는 늑대들이 가젤을 사냥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새끼 늑대를 늑대굴에서 훔쳐와 직접 기르기도 한다. 농장에서 자란 새끼 늑대가 울기 시작하면서 분노한 늑대들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책에서 늑대들의 사냥, 늑대와 인간들의 사투 등은 그야말로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 소설의 장점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틱낫한 등 현인의 가르침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소설 속 빌게 노인은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늑대들은 무리지어 목초지의 가젤을 사냥한다. 수백 마리의 가젤을 계곡속 눈구덩이에 몰아 넣어 천연 냉동시키며 겨우내 먹을 양식을 마련한 늑대들. 인간은 늑대 덕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젤 고기를 얻을 수 있다. 유목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먹을 만큼의 가젤만 가져간 뒤 나머지는 늑대를 위해 남겨둔다. 소식을 접한 한족 상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가젤을 모조리 수거했다. 굶주린 늑대들은 인간들이 키우는 양과 말을 먹기 위해 마을을 습격한다. 균형이 깨진 것이다. 결국 피해는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초원에서 늑대와 인간은 서로 주고 받는 관계이다. 늑대는 가축을 훔치는 대신 가젤 떼를 사냥해 가축이 먹어야 할 풀이 모조리 사라지는 걸 방지한다. 반면 인간은 늑대가 사냥한 가젤 떼를 얻기도 하고 새끼 늑대를 훔치기도 한다. 한족이 간섭하기 전까지 이는 절대적 균형 상태였다. 문명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균형은 무너졌고 드라마 같은 소설 속 사건이 발생했다.
-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