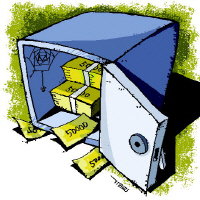|
근대 이전 유럽의 주화는 온전한 게 많지 않았다. 도둑질 탓이다. 화폐주조권을 지닌 국왕들은 전쟁비용이나 사치를 위해 금의 함량을 낮췄다. 일반인들은 동전의 모서리를 조끔씩 갈아 금을 모았다. 동전의 오톨도톨한 테두리도 갉아냄을 막기 위해 18세기에 선보인 것이다. 순도가 높은 새로운 주화가 나오면 혼란이 가셨을까. 정반대다. 새 돈은 장롱속으로 들어가고 저질 주화가 판쳤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에도시대 중기 실질적 국왕인 쇼군들은 은화의 함량을 낮춰 뱃속을 채웠다. 조선 인삼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고품위 특별은화(人蔘代王古銀)를 제외하고는 저질 주화는 경제를 흔들었다. 다시 순도 높은 은화를 공급하자 너도나도 저질 은화를 내놓았다. 영국왕실의 재정고문이자 외교관인 토마스 그레셤이 편지에서 이런 현상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레셤의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지동설을 주창했던 코페르니쿠스가 '화폐론'에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레셤이든 코페르니쿠스든 요즘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풀려나간 5만원권의 환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꺼림칙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환수율이 25.4%로 전년(48.2%)의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금을 두려워한 자금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결제수단인 5만원권을 모아 장롱속으로 혹은 비닐에 쌓은 채 논두렁 밑에 묻히는 것은 아닐까. 범죄나 세금 회피라는 반사회적 요인(악화)이 5만원권(양화)을 퇴장시키고 있는 셈이다.
△5만원권이 선보인 2009년 이후 줄어들었던 1만원권의 발행이 지난해에는 증가세로 반전된 점도 심상치 않다. 애초에 5만원 발행의 명분 중 하나였던 1만원 발행비용 과다를 억제한다는 효과가 사라졌다면 성급한 판단일까. 고액권 발행의 순기능보다 우려했던 역기능이 두드러지고 있다. 훗날의 역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3년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비현실적 목표와 고액권의 잘못된 만남으로 되려 지하경제가 커지고 세수 기반을 약화시켰던 시기.' /권홍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