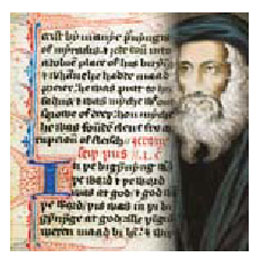|
1384년 12월31일,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가 64세를 일기로 죽었다. 자연사한 지 44년이 지난 1428년 교회는 그의 시신을 파내 태웠다. 뼈는 갈아서 강물에 뿌렸다. 왜 그는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을까. ‘불온한 사상을 퍼뜨린 이단’이었기 때문이다. 267개에 달하는 그의 죄목 중 가장 큰 죄는 성서 번역.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번역본을 내봤다는 데 대해 교황은 분노했다. 성서는 성직자들의 독점물이었으니까. 위클리프는 신학자ㆍ성직자이면서도 평생을 교황과 교회에 대한 영국 국가의 권리 회복과 개혁에 바친 인물. 마르틴 루터보다 160년가량 먼저 태어나 참회를 통한 교회의 거듭남을 주창해 ‘종교개혁의 새벽별’로 불리는 인물이다. 모교인 옥스퍼드에서 최고의 교수로 명망을 날리던 그는 교황의 권위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는 한 교황이나 추기경도 보수가 높은 세속 직업일 뿐’이라는 그에게 대중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복음의 정신에 따라 청빈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회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성직자들의 증오를 유발하고 이단 시비를 불렀다. 최초의 영어 성서를 펴내면서 그는 속죄나 보상을 뜻하는 ‘atonement’를 비롯해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등 근대 영어의 형성에도 이바지했다. 위클리프가 뿌린 씨앗은 종교개혁은 물론 유럽 각국의 종교적 사대주의부터의 탈출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고가 자본주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생전에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죽어서는 시신마저 갈렸지만 그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실을 압박하고 정보를 독점ㆍ통제하려는 그 어떤 압제도 오래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