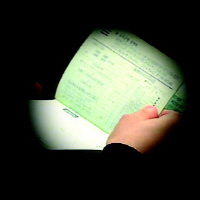|
1962년 5월 발행된 100환짜리 지폐에는 한복 차림의 어머니와 색동옷을 입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저금통장을 펴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과거 저축이 미덕으로 꼽히던 시절에는 손때 묻은 저금통장이 서민들의 '재산목록 1호'였다. 동네 은행을 드나들며 낡은 통장에 찍혀나오는 깨알 같은 숫자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의 큰 위안거리였다.
가로 14㎝, 세로 8.7㎝ 크기에 20쪽 남짓한 종이로 이뤄진 저금통장은 한국인들에게 근면의 상징이자 사랑의 징표이기도 했다. 매년 10월이면 전국에서 저축왕으로 뽑힌 이들은 너나없이 수상소감에서 통장을 300개, 많으면 400개까지 갖고 있다며 몸에 밴 근검절약을 자랑하기도 했다. 시골 어머니들은 장롱 속 깊숙한 곳에 저금통장과 도장을 꼭꼭 숨겨놓았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아들의 손에 몰래 쥐어 주고 뒤돌아 눈물을 흘리곤 했다. 실물통장이 한때 최고의 뇌물수단으로 대접을 받았던 적도 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아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거액을 입금한 뒤 도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뒤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종이통장은 구한말인 1897년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처음 선보였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통장은 우리은행의 전신인 천일은행이 1899년에 발행한 것이다. 옛 서책과 비슷한 모양으로 붉은색 도장을 찍어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종이통장이 금융거래에서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금융당국은 발행비용을 절감하겠다며 2017년 9월까지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고객이 원하면 수수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니 은행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뱅킹이 우리에게 익숙했던 또 하나의 정겨운 추억을 앗아가 버린 셈이다.
/정상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