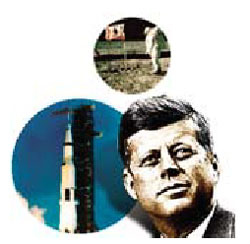|
1961년 5월25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의 긴급 과제에 대한 특별 교서’를 발표했다. 골자는 ‘10년 이내 달 착륙’. 아폴로 계획의 시발점이다. 왜 ‘긴급’이라는 언어를 동원했을까. 위기감 탓이다. 연설시점은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해 미국에 ‘가가린 쇼크’를 안긴 지 43일 후. 부랴부랴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힌 셈이다. 케네디의 연설에 미국인들은 환호하면서도 반신반의했지만 미국은 끝내 1969년 7월 아폴로11호의 달 착륙 성공으로 꿈을 이뤘다. 우주개발의 주도권도 미국에 넘어왔다. 소련은 왜 우세를 유지하지 못했나. 돈 때문이다. 미국이 아폴로 계획에 투입한 예산은 250억 달러. 뿐만 아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는 2,340억 달러(2005년 가치 기준)를 쏟아부었다. 같은 기간 중 소련의 우주 개발 비용은 미국의 20~30% 수준에 머물렀다. 우주개발 경쟁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드리워진 복병의 하나다. 케네디를 흉내냈는지 부시 대통령은 화성 정복을 꿈꾸지만 문제는 역시 돈. 80억 달러로 예상했던 우주정거장 건설 비용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다.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우주개발에 중국도 끼어들고 있다. 한국의 제1 교역 파트너인 중국이 만에 하나 옛 소련처럼 미국과의 경쟁에서 다리가 찢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월석(月石) 채집 경쟁에 투입한 자금을 생산과 복지에 활용했다면 ‘보다 나은 사회’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비평에도 강대국들은 우주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군사기술 축적이라는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를 향한 새로운 경쟁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발걸음일까, 우화(愚話)의 반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