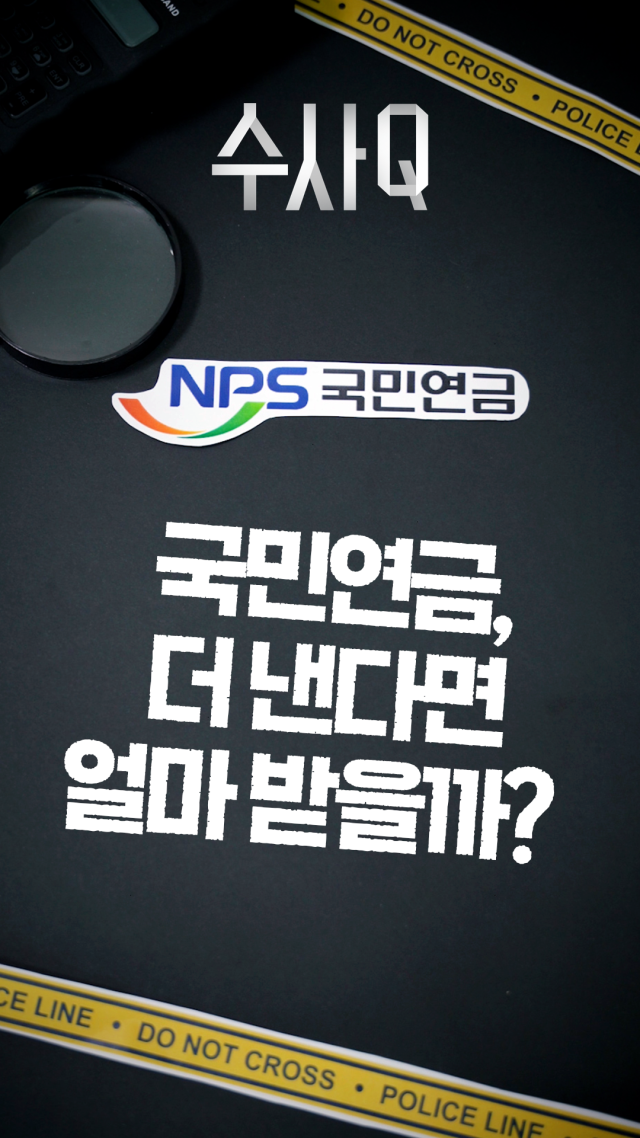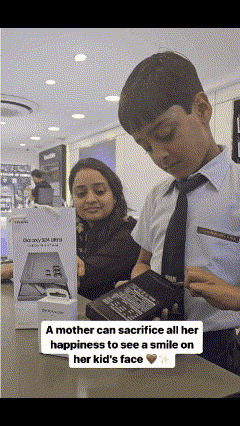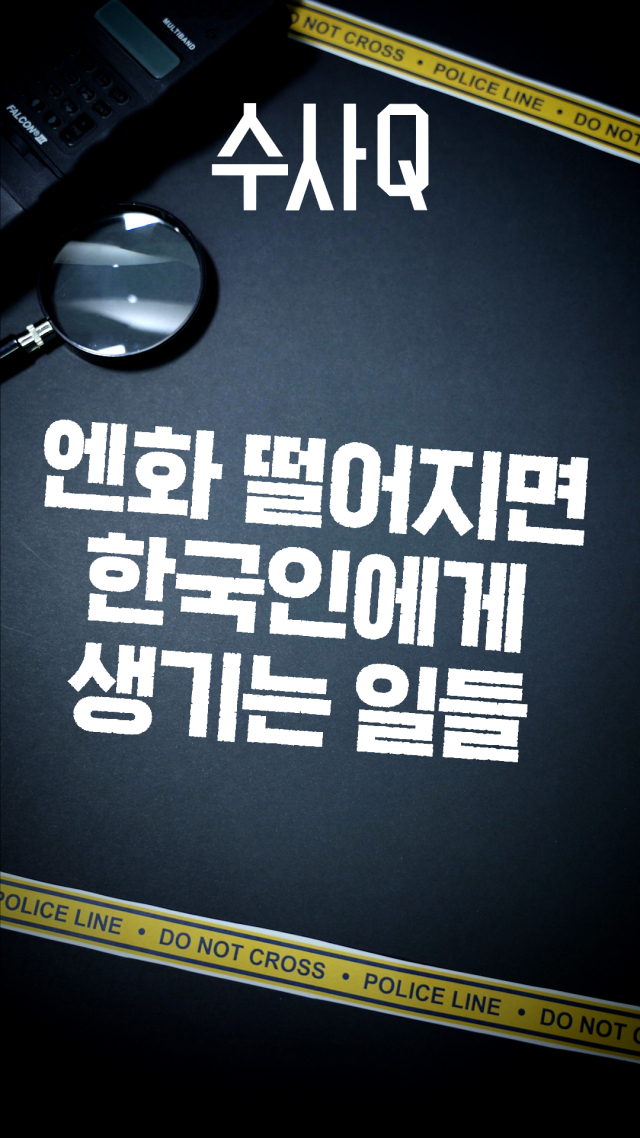SetSectionName();
수도권도 아파트 '바지 전매' 극성
잔금 마련 어려워지자 수수료 주고 분양권 넘겨바뀐 계약자 잠적하면 시공사가 손해 떠맡아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직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재건축 분양아파트 156㎡형을 2가구나 계약했다. 단지규모가 3,000가구 정도로 큰데다 청라지구와 인접해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은 뒤 입주시기가 되면 웃돈을 붙여 되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A씨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웃돈은커녕 2,000만~3,000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본전을 건지기도 힘들어졌다.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탓이다.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던 그는 얼마 전 인근 중개업소에서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일명 '바지계약자'를 앞세워 분양권을 전매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잔금 부담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 A씨는 결국 중개 브로커와 바지계약자에게 각각 500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뒤 12억원에 달하는 잔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아파트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이런 경우 수수료는 물론이고 계약금도 고스란히 떼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경기침체 속에 잔금 압박이 워낙 심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바지계약자를 통한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지계약자는 실제 계약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런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원계약자는 나머지 중도금을 치르지 않아도 돼 잔금을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이런 '바지전매'는 최근 대규모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는 수도권 대형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방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상이 수도권에도 상륙한 셈이다.
지난 2007년 말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서 한 아파트를 2가구 계약한 B씨 역시 최근 바지전매를 고려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할부 등의 금융혜택 덕에 그동안에는 이자 부담이 없었지만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와 잔금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던 웃돈은 붙지 않고 도저히 잔금을 마련할 여력은 없던 차에 바지전매를 제안해온 곳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바지전매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승계상 뚜렷한 하자가 없는 사람을 내세우면 전매를 거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바지전매가 의심돼도 사적 거래를 막을 도리가 없다"며 "바뀐 계약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면 모든 손해는 시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