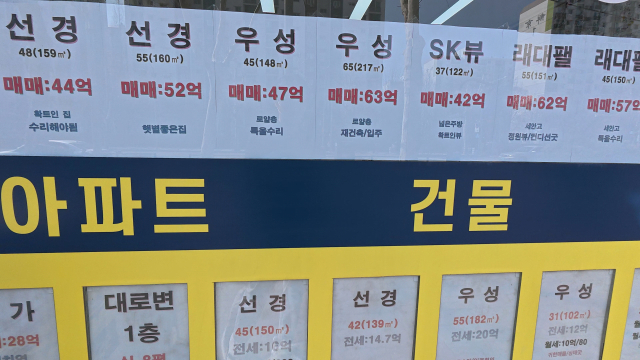대법원이 정년과 관련해 직장내 남녀차별을 금지시킨 대표적인 판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던 김영희씨는 43세로 정년을 맞았다. 그는 교환원의 정년이 43세로 짧은 것은 다른 일반직원들의 정년 55세에 비해 월등이 낮은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남여차별을 한 것이라며 정년퇴직무효소송을 82년12월31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당시 우리나라 전화교환원은 7,480명. 이 가운데 남자교환원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7,477명은 여성이었다.
서울지방법원은 83년6월21일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교환직렬이 규정상 남녀 모두에게 개방돼 있고 그 정년은 직종의 특수성, 근로자의 수급 등을 감안해 과거부터 43세로 정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교환직렬에 여성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남여차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도 85년2월15일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김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여성단체들도 「여성차별 정년무효확인소송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1심에서는 정귀호(鄭貴鎬)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고, 민경식(閔京植)·조관행(趙寬行)판사가 배석했다. 鄭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이다.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김석수(金碩洙)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김용담(金龍潭)·이두환(李斗煥)판사가 배석했다.
대법원 제2부는 88년12월27일 김씨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환직렬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의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도록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남녀차별 금지규정에 해당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직장내에서의 남녀차별대우 여부를 규정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보아 불평등한 점이 있으면 결국 차별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직장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당시 이 재판에는 이회창(李會昌)·배석(裵錫)·김주한(金宙漢)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씨를 위해 국내 최초의 여성법조인인 이태영(李兌榮)변호사와 강기원(姜基遠)·황산성(黃山城)·홍성우(洪性宇)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姜변호사는 현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김씨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89년4월19일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같은해 6월14일 복직해 근무하다 87년9월 교환원정년이 53세로 늘어남에 따라 92년12월31일 53세로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공사가 일반직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는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58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신공사를 상대로 또다시 법적 싸움을 벌이고 현재 이 법적싸움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통신공사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정년을 바뀌어 오면서 지난95년10월 교환직렬 직원들의 정년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58세로 늘렸다. 김씨는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부회장을 지내고 현재 훈련고용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