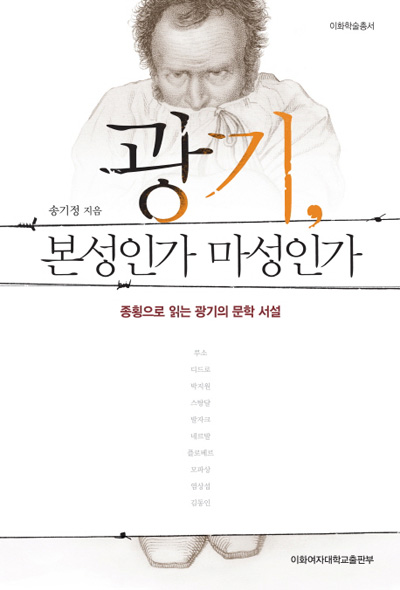■광기, 본성인가 마성인가(송기정 지음, 이화여대출판부 펴냄)
광기(狂氣)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넓은 의미로 쓰인다. 정신병이나 정신 착란을 의미하는 질병의 의미인가 하면, 과도한 열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술적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인 저자는 "중심이 아닌 주변, 곧음이 아닌 삐딱함, 억압이 아닌 자유, 복종이 아닌 반항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간의 기본 속성이며 인간이 소유한 이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치, 철학, 역사에서 억눌리고 침묵을 강요 받았던 광기는 문학에서 말하는 주체가 된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사실주의 작가로 평가받는 18~19세기 프랑스 작가들의 내면에 숨은 광기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19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나타난 광기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학으로 관심이 옮겨졌다"고 밝혔다.
저자는 루소의 '참회록'을 통해 박해망상과 편집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광기의 흔적과 모파상의 단편 소설 속에 나타난 작가의 자아 상실의 공포를 분석한다. 스탕달의 '아르망스'에서 나타나는 실어증과 네르발과 염상섭의 작품에 나타난 우울증과 죽음의 욕망, 플로베르의 '성 앙투안의 욕망'에 나타나는 환각과 욕망의 모습을 추적한다. 또한 박지원의 '염재기'를 통해 진정한 자아 상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광인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자라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철학자와 문학가의 작품 속에 표현된 병적인 광기를 추적하는 저자는 그 속에서 광기가 갖는 일상의 장벽을 넘어서는 창조의 원동력과 자아의 본질을 탐색하는 긍정적인 힘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문학이 인간에 대한 탐구임을 상기할 때 문학과 광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결국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인간이 갖는 이성과 비이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존중할 것을 제안한다. 1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