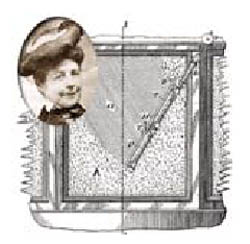홈
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1월10일] <1238> 윈도 와이퍼
입력2008.11.09 18:00:51
수정
2008.11.09 18:00:51
갑작스레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윈도 와이퍼까지 고장 나 꼼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간단한 부품이지만 차량 주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윈도 와이퍼.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답은 메리 앤더슨(Mary Anderson).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에서 부동산개발업과 포도농장을 하던 39세의 독신여성 앤더슨이 전차를 타고 뉴욕을 여행하던 중 빗물 때문에 운행에 차질을 빚는 광경을 보고 ‘창문 닦기(windshield wiper)’를 발명해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마침 이웃의 유산을 상속 받아 연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덕택에 발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미국 연방 특허 등록일 1903년 11월10일.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가 레버를 돌리는 수동식인 앤더슨의 와이퍼는 성공했을까. 그렇지 못했다. 와이퍼 자체의 성능도 좋지 못한데다 자동차를 둘러싼 여건이 미성숙했던 탓이다. 도로의 대부분이 비포장인데다 지붕이 없는 무개차도 많아 비오는 날의 운전을 금기로 여겼던 시절, 앤더슨의 특허는 특허기간인 17년이 지나도록 상품화하지 못했다. 호응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윈도 와이퍼가 자동차의 기본 옵션으로 등장한 것은 1920년. 1929년에 자동식이 나오고 1940년께에서야 오늘날과 같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와이퍼가 선보였다. 발명 당시 39세의 독신여성이던 앤더슨은 1953년 87세라는 천수를 누렸지만 특허의 진가와 그 영향력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친척들은 포드와 GM이 특허를 훔쳐갔다며 소송전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만약 포장도로가 보다 일찍 깔려 악천후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발명의 상품화화 함께 앤더슨의 이름도 기억됐을지 모른다. 아이디어의 상품화는 이토록 힘들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