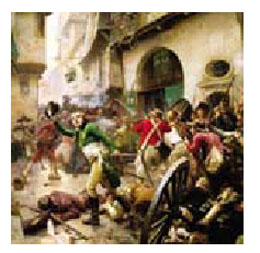|
1793년 3월3일, 프랑스 서부 숄레 지역.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도화선은 혁명정부가 내린 교회 폐쇄 명령. 혁명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반발로 여겼지만 봉기는 방데(Vandee) 전역으로 번졌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최대의 반혁명 사건인 ‘방데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혁명정부가 농민을 위한다며 성직자의 특권과 봉건제를 폐지했음에도 왜 반혁명이 일어났을까. 기득권층의 몰수된 재산이 도시 부르주아에게 돌아갔을 뿐 농민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 탓이다. 생활비의 절반 수준이던 식량 구입비가 88%로 치솟은 물가고로 불만이 쌓인 마당에 외침에 대비한다며 강행한 ‘30만 징병’도 반혁명에 기름을 부었다. 왕조에 동정적이던 농민들의 반혁명은 자연스레 옛 봉건귀족ㆍ가톨릭세력과 연결돼 6만5,000여명이 ‘가톨릭과 국왕의 군대’라는 기치 아래 모였다. 방데 반란군은 6월 중순까지 주변을 점령했으나 기세는 바로 꺾이고 말았다. 농번기를 맞아 병사들이 농지로 돌아간 가운데 4만5,000여 진압군에게 농민군 2만 5,000여명이 희생당했다. 1795년 초 영국의 지원을 받은 망명귀족들과 연합한 재봉기도 판세를 돌리지 못했다. 방데의 반혁명은 오히려 혁명의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무능을 이유로 탄핵 당하고 보다 강경한 산악파가 정권을 잡아 프랑스는 날마다 수백명씩 단두대에 오르는 공포정치 시대를 맞았다. 공포분위기 속에서 25만여명의 방데 주민이 학살됐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 방데에서 학살의 흔적이나 지역감정을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축제와 돈벌이가 한창이다. 1,500여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초대형 뮤지컬 ‘방데 농민혁명’을 비롯한 역사테마 관광에는 연간 200만명이 찾아와 350억원의 돈을 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