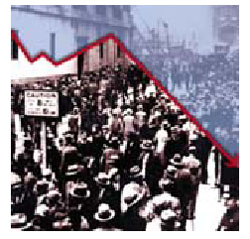|
거대기업 출현과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 1890년대 중반 미국 경제공황의 결과물이다. 공황의 확인점이자 출발점은 1893년 5월5일. 전종목의 주가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왜 폭락했을까. 유통물량 최다사인 내셔날코디지(NC)의 도산 때문이다. 최우량 종목으로 꼽히던 필라델피아&리당 철도회사의 파산(2월)에 이어 NC사의 도산으로 투자자들은 투매에 나섰다. 파동은 금융권과 기업, 경제 전반으로 번져 500여 은행과 1만5,000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단기금리가 연 125%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 파경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셔먼 은구매법과 영국계 증권사 베어링브러더스의 파산이다. 셔먼 은구매법은 매년 미국 정부가 일정한 은을 구입한다는 약속. 구매자금 방출로 금이 줄어드는 마당에 아르헨티나 투자 실패로 영국계 베어링브러더스가 파산하자 금 값은 더욱 뛰었다. 금 보유액 감소는 은행의 보수적 영업, 기업자금 경색으로 이어졌다. 1892년까지 3%에 머물던 실업률도 1894년에는 18%선까지 올랐다. 불황극복 요인도 두 가지. 금융과 자연이다. 로스차일드 등 영국 자본과 모건하우스의 신디케이티드론으로 금 고갈 위기를 넘겼다. 세계적인 흉작에도 1895년 미국 대풍은 국제수지 적자를 크게 줄였다. 공황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합병을 서둘렀다. US스틸 등 미국 대기업이 이때 생겼다. ‘자본주의는 주기적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확인되면서 사회주의 이론도 크게 퍼졌다. 공황은 단지 옛날 얘기일까. 경제사학자 피터 번스타인의 말을 들어보자. ‘베어링 위기와 1893년의 공황, 그리고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는 너무도 닮았다.’ 언제든 공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