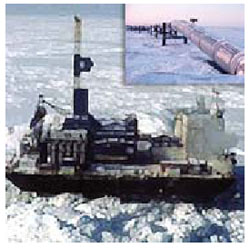|
1967년 12월26일, 알래스카 프루도(Prudhoe)만. 북위 70도, 영하 35℃의 강추위 속에 사람들이 시추정 주위로 몰려들었다. 진동음 때문이다. 소음의 정체는 천연가스. 굉음과 함께 천연가스는 강풍을 뚫고 거대한 불기둥을 토해냈다. 알래스카에서 검은 황금이 발견된 순간이다. 이듬해에는 11㎞ 떨어진 곳에서도 원유가 솟아 거대 유전의 존재가 밝혀졌다. 가채 매장량 100억배럴로 북미 최대인 알래스카 유전의 발견에는 행운이 작용했다. 포기 직전 마지막 시추공에서 대박이 터진 것이다. 시추 성공은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다. 혹독한 기후 탓이다. 한겨울이면 영하 65℃의 추위에 땅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고 땅을 겨우 헤집으면 만년빙이 나타나 채유봉을 부러뜨렸다. 더 큰 문제는 운송. 쇄빙 유조차 도입, 점보 제트 유조비행기 제작방안에서 그린란드에 핵폭탄을 폭발시켜 해저항구를 만들고 핵잠수함 유조선단을 동원해 북극해의 얼음 밑으로 원유를 수송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론은 파이프라인 건설. 거액을 들여 직경 1.2m짜리 파이프 50만톤을 사들이자 이번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5년간 늦춰졌다. 결국 공사비 80억달러를 쏟아 부어 1977년에야 길이 1,287㎞의 송유관이 완공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알래스카 유전과 파이프라인은 요즘 국제유가를 좌우하고 있다. 정상가동 여부에 따라 미국의 비축유 물량이 결정되고 유가도 춤춘다. 중요한 대목은 개발 여지가 무궁하다는 점. 환경보호와 개발 코스트가 비싸다는 이유로 알래스카 개발은 첫 삽만 뜬 상태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평당 1원 꼴로 720만 달러에 사들인지 100년 만에 석유를 선사한 알래스카는 얼마나 더 많은 황금을 품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