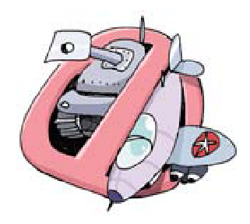|
1996년 5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 부근 바세나르 마을.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이 맺어졌다. 목표는 전략물자와 재래식 무기의 수출통제. 공산권 붕괴에 따라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코콤ㆍCOCOM)을 대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수출통제 조약으로도 불리는 새로운 국제규제는 이전의 코콤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달랐다. 우선 회원 수가 많았다.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으로 국한된 17개 코콤 회원국에 비해 바세나르 협약에는 33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남미, 심지어 러시아와 체코ㆍ헝가리 같은 옛 동구권 국가들까지 창립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수출금지 대상국을 명시하고 있는 코콤과 달리 대상국을 명시하지도, 국제감독기구도 없다는 점 역시 바세나르 체제의 특징. 회원국들의 국내법이나 자체적인 규정으로 수출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로써 미국의 입김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회원국 간 협의체였던 코콤과 달리 바세나르 체제는 미국이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회원국들이 ‘알아서’ 따르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기준 역시 모호할 때가 적지 않다. 486급 컴퓨터까지 전략물자에 포함하는 통에 북한 지역에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작업이 차질을 빚은 적도 있다. 간혹 테니스 라켓이나 낚싯대 제조설비가 신소재 전략물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략물자인 줄 모르고 수출했다가 최고 수출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담하는 국내 업체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형편이다.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수출통제품목 목록은 더욱 혼동을 일으킬 것 같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과 교류증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지 품목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높다.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실제 효과는 거의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