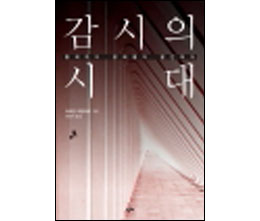|
총선 전날까지 우리나라는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로 시끄러웠다.
사찰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군사독재가 끝난 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인의 인권을 휴지장 처럼 구겨져 버리는 야만의 국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 '공공안전'의 목적'과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 수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책은 이를 위해 19세기 후반 군중심리학에 의해 정의된 사회운동이나 움직임에서 대중에게 낙인을 찍고, 위조 불가능한 신원을 부여하는 지문 사회가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부터 훑어나간다. 아울러 국제 신분확인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을 분석한다.
19세기 프란츠 요제프는 골상학으로, 아돌프 케틀레는 인체 측정학을 통해서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행위의 도식표를 만들어냈다. 또 에밀 드 지라르댕은 '신분증명서' 발급을 제안했다. 이런 시도들을 시작으로 알퐁스 베르티용은 신분식별 서비스의 설계를 완성했고 범죄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후안 부세티치는 아르헨티나에서 지문 감정법을 도입하고 실험했다. 이처럼 위조의 가능성이 적은 신체적 서명을 찾는 것은 인체감정이나 지문감정의 공통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거의 한 세기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의 권리침해와 사생활침해를 우려해, 생체 측정식 신분 식별화 시스템의 보편적인 적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식별 시스템의 신호탄으로 유럽연합은 전자칩과 디지털화된 사진이 부착돼 얼굴 자동식별이 가능해진 '생체정보식 여권'의 미국식 모델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또 영국은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체정보식(지문, 얼굴, 홍채 인식) 신분증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가에 개인정보 등록을 제도화하는 법률을 반포했다. 이것은 e-ID카드의 도입을 의미한다.
생체정보 등록 계획은 IC칩과 생체정보를 판독하는 기술을 이용해 정보화된 신분증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보안전자신분증 INFS 계획을 통해 신용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일반화시키려고 한다. 이 카드에는 소지인의 생체정보가 저장되는데 이것은 기밀로 분류되고 오직 공권력과 허가를 얻은 행정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공공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명분으로 개인 생체정보의 표식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 인정하며 누군가의 정보가 문서화되고 관찰되고 탐지되고 추정당하는 것에 무관심해져 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책은 "공공안전 질서에 대한 비판은 정보화의 헤게모니 위에 탄생한 도그마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며 "경찰의 통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전 증대가 지닌 상호 모순을 해소시켜줄 방식 중 하나는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과 그것의 실현 조건인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커뮤니케이션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만7,500원.